[경제] 눈 가리고 자율주행 척척 “15조 시장 보인다”
-
1회 연결
본문

지난 15일 판교 서울로보틱스 연구개발(R&D) 센터에서 위장막으로 시야를 가린 차량이 인프라 기반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삼권 기자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서울로보틱스 연구개발(R&D) 센터. 7500㎡(약 2270평)의 시험 주행 공간에 빨간 위장막으로 앞유리까지 가린 차량 4대가 차례로 나타났다. 2대의 트럭과 세단,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각각 순서대로 ‘8’ 모양을 그리며 안정적으로 주행했다. 중앙 통제 인프라를 통해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움직이는 무인 탁송 기술을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는 “사람이 1시간 걸렸던 일을 5분만에 해결할 수 있다”며 군집 자율주행 체계를 설명했다. 이 기술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길에 센서를 설치하고, 중앙 제어 시설에서 수백 대의 차를 동시에 움직이는 기술이다. 이 대표는 “군집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건비가 들지 않아 비용과 시간을 90% 이상 아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동차는 군집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다. 차량에 내장된 심카드(차량 식별 칩) 정보를 중앙 제어 시설에 입력하면 각 차량의 운전대와 브레이크, 액셀을 원격으로 조종한다.
군집 자율 주행 서비스가 겨냥하는 것은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이다. 테슬라·웨이모 등이 로보택시로 도전하는 소비자 시장(B2C)보다 규모는 작지만, 수요가 많은 틈새시장이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언스트앤영(EY)은 B2B 자율주행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30년 112억 달러(약 15조6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글로벌 B2C 자율주행 시장이 수경 원대 시장이라면, B2C 시장은 수조 원대 수준”이라면서도 “자율주행 스타트업이나 보쉬·콘티넨탈 등 자동차 부품 기업이 도전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사는 무인 운반 차량(AGV)을 활용한 물류 자동화에 도전하고 있다. 심카드가 내장된 첨단 제품이 아니더라도 물리적으로 여러 물건을 옮길 수 있어 범용성이 더 뛰어나다는 이점이 있다. 현대차그룹의 부품 계열사 현대위아는 지난 3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문을 연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 신공장에 자동차 부품을 운반하는 AGV를 도입했다. HL만도는 2023년 자율주행 주차 로봇 ‘파키’를 출시한 이후 물류 자동화 로봇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특정 인프라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물류 자동화와 여러 변수 있는 도심 자율주행은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도심 자율주행은 미국·중국 등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물류 자동화에서는 틈새시장을 잘 노린다면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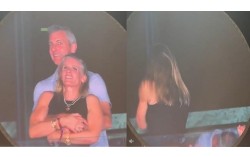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