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 다른 항공참사 막으려면... “항공안전청 신설, 사조위 독립”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
1회 연결
본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째인 지난 7일 무안공항에서 유가족들이 분향소 제단에 '봄꽃화단'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179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넉 달이 다 되어 간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사고 당시 여객기의 엔진 기능 일부가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도 공개돼 사고 원인과 과정을 두고 의견이 더 분분해졌다.
이 사이 국토교통부는 사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형 로컬라이저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된 다른 국내 공항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이어 해당 시설의 철거 및 보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 조류충돌)’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키로 했다. 국제 권고기준(240m)에 미달하는 무안·여수공항 등 7개 공항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도 추가로 확보한다는 대책도 밝혔다.
이처럼 참사 이후 여러모로 항공안전 강화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또 다른 항공참사를 방지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FAA 같은 조직 필요
무엇보다 현재 국토부 항공정책실의 항공안전정책관(국장급) 산하에 두고 있는 항공안전 관리조직을 미국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등 주요 선진국처럼 항공안전청 수준으로 확대·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항공안전정책관 산하에는 직원이 100여명 있지만, 이 중 항공사 인허가 관련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과 항공사의 안전관리 상태를 살펴보는 감독관은 모두 30여명에 불과하다.
윤문길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항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많은 공항과 항공사의 항공안전 규제 및 관리를 담당하기에는 조직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만희 전 국토부 사조위 위원장도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조직과 인력이 핵심”이라며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각 나라의 안전감독시스템을 평가하는 중요 기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일보
실제로 ICAO의 36개 이사국 중 32개국이 항공안전청같은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산하에 FAA가 별도 기관으로서 미국 내 항공기 개발·제조·운행 허가, 항공사 관리·감독 등 항공안전과 관련한 전권을 행사한다.
MB 때 항공안전본부 폐지
영국 역시 교통부 산하 기관인 민간항공청(CAA, Civil Aviation Authority)이 항공기와 항공 장비에 대한 면허와 안전관리, 조종사 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앞서 유사한 조직이 있었다. 1990년대 연이은 국적 항공사의 사고 탓에 2001년 FAA 평가에서 항공안전 2등급으로 떨어지면서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당시 건설교통부 산하에 항공안전본부(1급 본부장)를 별도로 설치했다.
이전까지 건교부 항공국에 3~4개과로 있던 항공안전 정책 및 감독 기능을 떼어내 2개국 10개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약 4개월 만에 항공안전 1등급을 회복했다.

2002년 설립된 항공안전본부는 2009년 폐지됐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한다는 명문 아래 항공안전본부가 폐지되고, 관련 기능이 국토해양부의 항공정책실로 다시 합쳐졌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연명 한서대 항공융합대학원장은 “국내 공항을 운항하는 국적기와 외항사의 항공편수가 2000년 27만여대에서 지난해에는 70여만대까지 늘었다”며 “항공산업의 급성장에 맞춰 항공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항공안전청 설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탓 '셀프조사' 논란
전문가들은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조직 역시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사조위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조직인 탓에 ‘셀프조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항공안전 정책 수립과 감독은 물론 사고 조사까지 국토부와 산하 기관에서 다 수행하는 탓이다. 게다가 사조위는 사고조사관이 10명도 채 안 돼 상시적인 인력 부족과 업무 과다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처럼 다른 부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 NTSB도 처음 설치된 1967년에는 교통부 산하였지만 1974년 교통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 됐다.

지난해 말 무안공항 사고현장에서 미국 NTSB와 보잉사, 국토부 사조위 관계자들이 로컬라이저 둔덕에 올라 사고기체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은 “우리 사조위는 국토부 산하 기관인 데다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상임위원을 맡는 등 독립적인 조사와 판단을 하기에는 제약요건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문길 교수도 “국토부와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에서 사고 조사를 해야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에 조직·예산 전폭 지원해야
항공안전청 신설과 사조위 독립 외에도 ▶항공안전 감독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항공사 면허 기준 강화 ▶항공기 정비기준 개선 ▶정비인력 확충 및 정비훈련 강화 ▶관제사 역량 강화 등 여러 개선안도 같이 제기되고 있다.
마침 국토부도 이달 말께 전문가와 업계 의견 등을 모아 항공안전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방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다. 바로 조직과 예산 확보 가능성이다.
아무리 혁신적인 방안이 나오더라도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유사사례도 많다.
하지만 항공안전은 국토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는 누구나 해당하는 국민적 사안이다. 항공안전 시스템을 다시 세우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이 요구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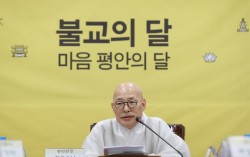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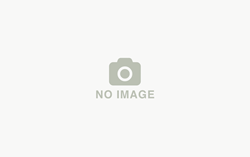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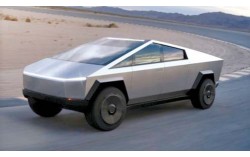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