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개는 매일 허탕치기 반복해도 즐거워하는데...인간은 '불완전한 철학자&a…
-
4회 연결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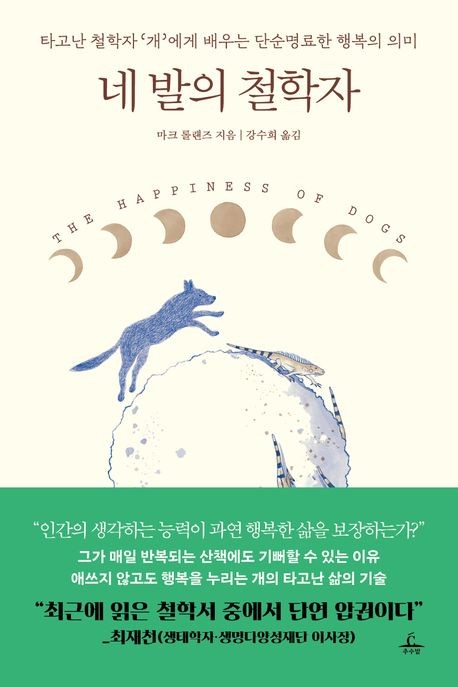
책표지
네 발의 철학자
마크 롤랜즈 지음
강수희 옮김
추수밭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철학의 근본 질문이다. 영국 출신으로 미국 마이애미대에서 마음‧윤리‧도덕심리학과 관련한 철학을 연구하는 지은이는 자신과 함께했던 개들을 관찰해 답을 찾아 나간다.
특히 수색‧구조‧보호견종 슈츠훈트 혈통인 섀도의 일상 행동을 살피다 ‘유레카’를 외친다. 섀도는 운하 변에 사는 파충류 이구아나를 잡으려는 질주로 하루를 시작한다. 언제나 허탕을 치지만 아침마다 이를 즐겁게 반복한다. 이처럼 반복적인 일로도 충만한 기쁨과 행복감을 느낀다.

지난 3월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브리나'라는 이름의 개가 이탈리아 국립 고산 ·동굴 구조대와 함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하지만 인간은 결실 없는 반복을 정신적 고문으로 여긴다. 인류에게 불을 전했다가 신의 미움을 사서 바위를 언덕 위로 올리다 굴러떨어지곤 다시 시작하기를 끝없이 반복하는 형벌을 받았다는 ‘시지포스의 바위’ 신화는 그 메타포다. 이처럼 인간은 반복적이고 소소한 일상에도 전념하는 개와 확연히 구분된다.
지은이는 차이의 원인을 자기성찰이 가능한 인간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회의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데서 찾는다. 실제로 소크라테스 철학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데서 출발하고, 계몽철학은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에서 시작한다. 소크라테스는 ‘캐묻지 않은 삶은 가치가 없다’고 했지만, 성찰과 거리가 있는 개의 단순명료한 삶이라 해서 과연 무의미한 것일까. 개는 남의 눈을 의식해 자신의 삶을 검열하거나 캐묻거나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원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지 않으냐는 이야기다.
인간과 개는 본성의 분출 방식에서도 대조적이다. 저먼 셰퍼드를 훈련해 사냥‧경비를 맡기면 본성을 풀풀 뿜어낸다. 섀도가 매일같이 이구아나와 다람쥐를 쫓으면서도 지루해하지 않고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이를 통해 공격과 보호의 본성을 발산하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본성이 약해져 다양한 사건의 의미를 따지고 진행 중인 상황의 과정과 결과를 과도하게 고민할 뿐이다. 지은이는 이러한 인간의 행동양식에선 행복이 분출될 도약대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인간을 ‘불완전한 철학자’로 부르는 이유다.
인간은 도덕 덕분에 개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에 대해 지은이는 개도 도덕적으로 행동한다고 반박한다.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면서 다친 동료의 곁에 있어 주고, 먼 거리를 오가며 먹이를 구해와 새끼나 주변 동물과 나누는 자기희생적 사례는 드물지 않다. 개의 도덕적 행동은 다른 개체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공감 능력과 가치에 맞춰 행동하는 억제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개는 인간 같은 복잡한 자기성찰 없이도 행동으로 도덕과 연민, 공존을 실천한다.
개가 세상을 경험하고 인지하는 방식에 대한 최신 연구가 소크라테스에서 흄‧화이트헤드‧사르트르 등의 철학과 한바탕 어우러진다. 지은이는 모든 동물의 인지와 삶의 방식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감각‧신체 경험과 행동 등 개체와 환경과의 상호반응 속에서 형성된다는 ‘체화된 인지론’을 주창해왔다. 원제 The Happiness of Dogs: Why the Unexamined Life is Most Worth Li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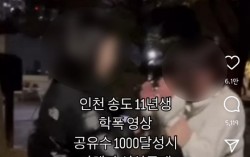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