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시집을 비웠다, 여운을 채웠다
-
4회 연결
본문

천양희 시인이 등단 60주년을 맞아 시선집 『너에게 쓴다』(창비)를 냈다. 표제작은 2020년 봄 광화문 글판에 올랐다. 장진영 기자
“60년이면 사람의 나이로는 이순(耳順)이거든. 근데 시에는 나이가 없어서 그런지 귀가 안 순해져.”
수수밭에 바람이 불면 ‘수수’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주저앉고 통곡했다. 집 앞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귀뚜라미가 ‘귀뚫어, 귀뚫어’하고 말을 걸었다. 이런 체험을 몸에 담아두다 시로 옮겼다. 천양희(83) 시인은 여전히 이렇게 몸으로 시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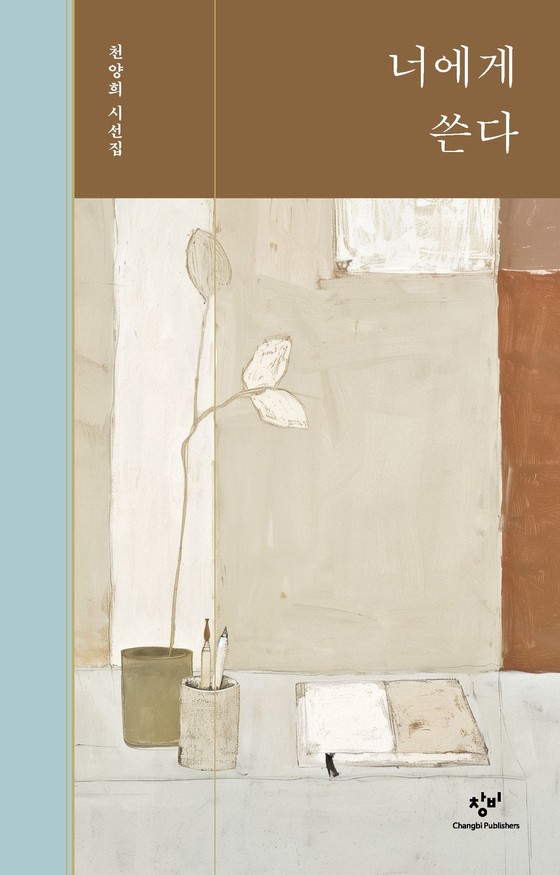
등단 60주년을 맞은 천양희 시인이 지난 11일 시선집 『너에게 쓴다』(창비)를 냈다. 이미 출간된 시인의 시집 중 짧은 시들을 모은 이 책엔 2020년 봄 광화문 글판을 단장한 표제작 ‘너에게 쓴다’도 포함됐다. “꽃 진 자리에 잎 피었다 너에게 쓰고/잎 진 자리에 새 앉았다 너에게 쓴다”(‘너에게 쓴다’ 일부)
지난 14일 서울 노원구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독자들이 내 시를 깊이 읽고 사랑해주는데, 나도 짧은 시로서 긴 여운을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폐렴으로 병치레한 시인은 “이런저런 일을 겪다보니 사는 거구나 싶다. 살아있으니 병도 앓는다”며 웃어보였다.
시선집엔 총 61편의 시가 수록됐다. 시인의 대표작인 『마음의 수수밭』(1994·창비), 공초문학상 수상작 『너무 많은 입』(2005·창비) 등과 절판도서에서 발췌한 작품까지 총 8권의 책에서 골라낸 짧은 시다. “내 인생의 단면을 쓰려니 길게 표현이 안 됐다. 내 인생의 굴곡을 한 마디로 표현한 시들이 많다.” 시집에는 “얼마나 많이 내 삶을 내가 파먹었는가” 이 한 줄이 전부인 시 ‘나의 숟가락’도 있다.
부산에서 태어난 천 시인은 9살 때 ‘너는 앞으로 시인이 될 거야’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화여대 국문과 3학년이던 1965년, 박두진 시인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그러다 서른둘엔 가족을 잃고 이혼을 겪으며 혼자가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 상태도 악화되어 첫 시집 『신이 우리에게 묻는다면』(1983) 출간까지 18년이 걸렸다.
그간 전북 부안의 직소폭포에 찾아가 죽기를 시도한 적도 있다. 그곳에서 ‘너는 죽을 만큼 살았느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 다시 살아보고자 결심했다. 그렇게 13년 만에 쓴 것이 ‘직소포에 들다’라는 시다. 또 다른 작품 ‘마음의 수수밭’도 수수밭에서의 체험이 시로 나오기까지 8년이 걸렸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 가장 먼 길이라서 그런 것 같다. 특히 두 시는 긴 정신의 고통을 거친 뒤에 쓴 글이라 대표작으로 삼고 있다.”
천 시인은 “사람들은 나를 상처줬지만 시는 나를 봐줬다”며 “이때까지 나는 시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독자의 존재가 그에게 위안을 줬다.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살려 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관절염이 생긴 손으로 여전히 시상(詩想)을 메모하고, 시를 눌러쓴다. “젊어도 보고, 늙어도 보니 지금에야말로 인생에 고맙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시와 같이 살고 싶다. 어서 건강해져 몸 닿는 데까지 낯선 곳 찾아다니며 시를 쓰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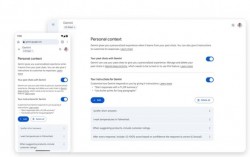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