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중일은 당당한 "인분 문화권" 흙으로 본 문명사와 자연사[BOOK]
-
3회 연결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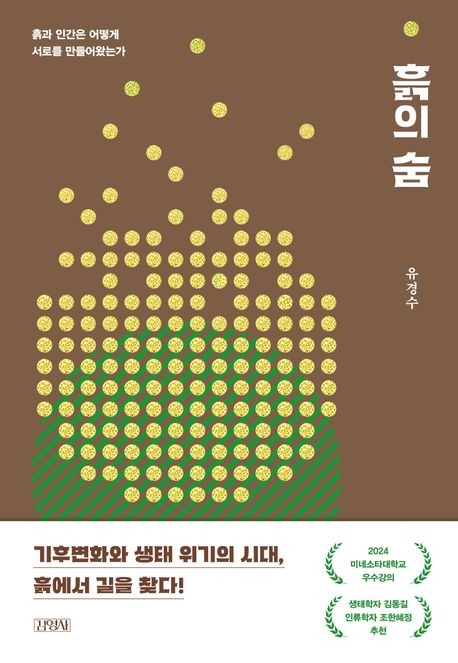
책표지
흙의 숨
유경수 지음
김영사
미국 미네소타대 토양학 교수인 지은이는 인류의 당면과제인 기후변화‧식량위기‧생태위기의 중심에 흙이 있다고 지적한다. 인류가 자연과 지속가능하게 공존해온 지혜를 함축하고 있어서다. 이 책이 훍의 자연사와 문명사를 동시에 다룬 이유도, 양자가 만나고 중첩하는 지점에서 인류가 지구를 망가뜨리지 않고 살아갈 지혜가 샘솟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책은 똥‧화전‧쟁기‧논‧물‧강‧지렁이‧땅, 그리고 흙의 몸, 흙의 숨 등 10개의 장으로 나눠 흙의 자연과학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문화를 현장연구 중심으로 다룬다. 하나하나가 인류 생존과 문화‧문명의 젖줄 역할을 해온 요소다.
첫 장인 ‘똥’에서 지은이는 인분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유지했던 한국‧중국‧일본을 ‘인분 문화권’이라고 당당하게 부른다. 서양문명은 그 효용을 도외시한 채 토지를 척박하게 방치했다고 지적한다. 인분비료 사용 여부는 흙을 다루고 농사짓는 방법의 차이일 뿐 위생 관념이나 문명 발달 척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17세기 런던 템즈강과 파리 센강에 둥둥 떠다니던 인분이 일본 에도의 하천에선 보이지 않았음을 근거로 든다.
가축 분변도 마찬가지. 제주도에선 ‘말테우리’라 불린 목동이 다른 농가의 묵밭(농사를 짓지 않고 내버려 둬 거칠어진 땅)에 말을 몰아주고 삯을 받아갔다. 척박한 토지를 경작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주는 과학적 방법이다. 말테우리는 이동식 비료공장 주인인 셈이다.
흔히 삼림황폐의 대명사로 통하는 화전도 알고 보면 농업과 자연의 조화를 상징한다고 지적한다. 역사가 1만 년에 이르는 화전은 경작할 때는 식량, 묵밭 상태에선 물‧버섯‧과일‧약재‧목재‧땔감, 야생동물에겐 삶의 터전까지 제공한다. 그래서 화전을 ‘인간과 자연 사이에 절묘하게 자리 잡은 공존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미국 곳곳과 히말라야 나갈랜드, 스웨덴 보트니아 해안 등에서 지은이가 탐구했던 자연, 그리고 공존을 위한 인류의 지혜를 만나는 즐거움도 만만치 않다. 지은이는 ‘흙은 경이롭지만, 인간이 알뜰하게 돌봐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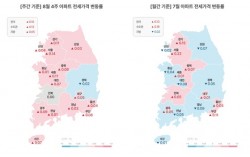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