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애마' 벗기려는 자들과 화끈한 맞짱…80년대 충무로를 벗기다
-
4회 연결
본문

'애마'에서 톱스타 정희란을 연기한 이하늬. 희란은 1970~80년대 노출 영화로 인기를 끈 당대 최고의 톱스타다. 사진 넷플릭스
“네가 꿈을 꾸었구나! 꿈을 깨는 데는 매가 약이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애마’의 한 장면에 등장하는 정희란(이하늬)의 대사다. 극 중 ‘애마부인’에 출연한 희란은 성적 욕망이 가득한 남주인공을 채찍으로 호되게 다그치며 이렇게 말한다.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리뷰
실제 1982년 개봉한 영화 ‘애마부인’에 나오는 장면은 아니다.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2006), ‘독전’(2018)의 이해영 감독이 자신의 첫 번째 시리즈인 ‘애마’를 연출하면서 현대 여성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장면이다.
22일 공개된 ‘애마’는 1980년대 충무로를 배경으로 당대 화제작이었던 ‘애마부인’의 제작 과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했다. 제목만 보면 또 하나의 성인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실상은 에로영화가 인기였던 시대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풍자하는 6부작 코미디다.

'애마'는 1982년 실제로 개봉한 영화 '애마부인'에 영감을 받아 제작된 가상의 이야기다. 사진 넷플릭스
앞선 제작발표회에서 이 감독은 “1980년대 당시의 욕망을 응집한 아이콘 같은 존재로 ‘애마’를 내세웠다. 그 시대의 편견과 폭력적인 오해와 맞서 싸우고 견뎌야 했던 모든 애마들을 응원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에 시리즈는 1980년대 충무로를 그대로 재현하고자 세트부터 신경썼다. 정이진 미술감독은 당시 충무로의 중심이었던 ‘청맥다방’을 비롯해 극의 배경이 되는 신성영화사 사무실과 영화 촬영장 곳곳에 화려한 컬러를 입혀 향수를 자극했다.

극중 배경이 되는 신성영화사 모습. 1980년대 포스터를 재현해 붙였다. 사진 넷플릭스

극중 신성영화사 대표 구중호(진선규)는 감독 곽인우(조현철)에 야한 장면만 가득한 영화를 만들면 된다고 강요한다. 사진 넷플릭스
당대 최고의 톱스타 정희란 역을 맡은 배우 이하늬는 1970~80년대 여배우들의 영상을 보고 서울사투리를 연습해 배역에 몰입했다. 화려한 의상과 우아한 몸짓을 더해 언제 어디서나 톱스타 품위를 유지하는 희란을 표현했다.
희란이 이성을 잃고 분노하는 순간은 신성영화사 대표 구중호(진선규)를 마주할 때. 희란은 젖가슴이란 단어로 도배된, 노출 위주의 ‘애마부인’ 시나리오를 거부하고 구중호와 맞선다. 하지만 중호는 계약서를 들이밀며 희란을 ‘애마부인’ 조연으로라도 출연시킨다. 돈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호 캐릭터는 진선규의 빈틈없는 연기로 생생하게 구현됐다.

배우 방효린은 극중 '애마부인' 역할로 발탁된 신인배우 신주애를 연기했다. 사진 넷플릭스
한편 ‘애마부인’ 주연에는 오디션을 통해 발탁된 신주애(방효린)가 나선다. 주애는 충무로의 야만적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해지고, 희란과의 갈등 끝에 여성 접대 자리가 일상화된 권력의 공간에서 묘한 동질감을 공유한다. 두 인물의 연대는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응원하게 한다. 주애가 여배우로 성장해가는 것처럼 희란의 내면도 단단해진다. 그는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연회장같은 여성 접대 자리가 불합리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를 부수려 한다.

화려하지만 촌스러운 신인배우 신주애(방효린)와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외모를 드러낸 톱스타 정희란(이하늬)의 대비가 눈길을 끈다. 사진 넷플릭스
연출 과정에서 이 감독은 사실적인 배경을 작품으로 끌고 들어왔다. ‘각하’라는 표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연상하게 한다거나, 1980년대의 실제 사건 위에 상상력을 보태는 식이다. 1980년대는 정책적으로 성 영화가 장려되던 시절이었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통제되던 모순된 시대였다. 실제로 영화 ‘애마부인’은 검열을 피하기 위해 말(馬) 자 대신 대마 마(麻) 자로 한자를 바꾸는 우스꽝스러운 과정을 겪기도 했다. 극 중에도 검열로 인해 대마 마를 사용하고 대본을 여러 번 수정하는 내용이 나온다.
‘애마’는 바로 이 시대적 아이러니를 정면으로 다룬다. 성 영화 출연을 강요받은 여배우들이 서로에게 기대며 만들어낸 독특한 연대는 이야기의 중심축이 된다. 비극적인 여배우의 희생이나 억지스러운 여성 연대로 포장하지 않는 것이 강점. 여성의 시각에서 유머 코드를 집어넣었다. 그 결과 작품은 단순한 향수극을 넘어, 과거의 모순을 현재적 언어로 비틀어낸 사회적 풍자로 의미를 더했다.

함께 말을 타는 주애와 희란. 사진 넷플릭스
작품을 미리 본 영화인들은 긍정적 추천사를 내놓았다. ‘거미집’의 김지운 감독은 “‘그땐 그랬지’ 식의 향수와 회고에 머물지 않는다. 서로를 지켜준 두 여성의 유대와 성장은 시간을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울림을 던진다”고 호평했다. 배우 고아성은 “과거 영화사 대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경외심을 갖다가도, 좌충우돌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보며 ‘아! 영화계란 본디 이랬구나’하고 깔깔 웃게 된다”고 추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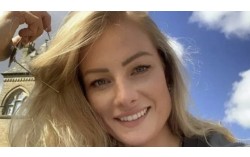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