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버터] '쓰레기산' 오르는 네팔 주민들…장화 한 켤레로 시작…
-
4회 연결
본문
국제풀씨 이야기
칼파바티카 소사이어티 네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네팔 바그마티주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 ‘반차레단다’에는 수도 카트만두 권역의 모든 쓰레기가 모인다. 폐기물 수거로 돈을 벌기 위해 이곳을 찾는 폐기물 노동자들이 ‘쓰레기산’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 바그마티=문일요 기자
초로의 여인이 낡은 앞치마를 둘러맸다. 볕이 드는 곳에 널어둔 장갑을 양손에 끼고, 이어 고무장화를 신었다. 힐끗 눈을 흘기고는 무심히 회색 진흙 길을 따라 올랐다. 네팔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국제공항에서 서쪽으로 약 27㎞, 차량으로 2시간 가까이 달려야 닿는 산악 지대. 카트만두 권역의 유일한 쓰레기 매립지 ‘반차레단다(Banchare Danda)’에는 도시의 모든 쓰레기가 모인다. 소위 ‘쓰레기산’이라 불리는 이곳이 여인의 일터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매립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맑았다. 8월은 우기(雨期)지만, 오전엔 맑고 저녁에 비가 온다고 했다. 밤새 온 비로 비포장도로는 질퍽였다. 그 길 위로 쓰레기를 실은 덤프트럭이 줄지었다. 지역 내 18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하루 1200t. 트럭들은 매립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정차한 뒤 쓰레기를 쏟고 다시 내려갔다. 트럭에서 내뿜는 매연과 폐기물 악취가 코를 찔렀다.
쓰레기산 곳곳에는 사람들이 허리 숙여 무언가 찾고 있었다. 매립지 운영관계자들은 이들을 ‘비정규노동자(informal waste pickers)’라고 불렀다. 쓰레기 더미 속 쓸만한 물건을 찾아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들이다. 고철은 1kg당 15루피(약 150원), 의류는 20루피(약 200원)를 쳐준다고 했다. 한 달 꼬박 일하면 1만 루피, 우리 돈 1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
지독한 가난 탓에 쓰레기산을 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인근 마을 주민이다. 네팔 정부가 매립지 반경 2㎞ 안에는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매일 400명 넘는 사람들이 이 산을 오른다. 정부 당국은 이들을 막아서지도, 지원하지도 않는다.

칼파바티카 소사이이어티 네팔 활동가들이 매립지 노동자에게 안전부츠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 칼파바티카 소사이어티 네팔]
한국에서 온 변화의 마중물
네팔의 비영리단체 ‘칼파바티카 소사이어티 네팔’(이하 칼파바티카)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매립지 노동자들에 주목했다. 매립지에는 플라스틱부터 비닐, 폐의류, 음식물, 의료폐기물까지 한데 뒤섞여 있다. 자치구마다 정책이 다르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날카로운 폐기물에 피부가 긁히고 찢기는 사고를 빈번하게 겪는다. 디파 라마 칼파바티카 대표는 “매립지 언덕 아래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폐기물에 파묻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현장은 위험하다”며 “개인보호장비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장비를 지급하고 교육하는 일이 급선무였다”고 설명했다.
칼파바티카의 활동은 2022년 재단법인 숲과나눔의 글로벌 시민 아이디어 지원 프로그램 ‘국제 풀씨(GSG)’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활동비 3000달러(약 410만원)가 마중물이 됐다.
환경과학을 전공한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칼파바티카는 자료 조사부터 시작했다. 폐기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연구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칼파바티카 조사에 따르면, 반차레단다 매립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일평균 471명이다. 이 가운데 60%가 여성이고, 절반이 넘는 56%가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다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최소 근무 기간은 1년,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은 18년으로 조사됐다.
칼파바티카는 다음 단계로 안전부츠를 만들었다. 신발끝에 강철 토캡을 씌워 외부 충격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고강도 미끄럼방지판으로 발바닥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 기후를 고려해 건기용과 우기용을 따로 구분했다. 건기용은 방화 기능을 넣은 대신 목을 짧게, 우기용은 방수 기능을 강화하고 목을 길게 설계했다. 그렇게 만든 안전부츠를 여성 노동자 50명에게 나눠주고, 피드백을 수집하면서 안전교육과 건강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했다. 라마 대표는 “노동자들에게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시간이 돈과 같기 때문에 좀처럼 교육에 참여시키기 어려웠는데, 장화 한 켤레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안전장비 지급은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며 궁극적으로는 기술·금융교육을 제공해 안정적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부츠를 신고 일하는 폐기물 노동자들. [사진 칼파바티카 소사이어티 네팔]
골목 프로젝트에서 법제정 논의까지
이듬해에는 도심의 폐기물 노동자 지원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사업 대상지는 카트만두 내 자치구인 나가르준시. 이곳에서는 쓰레기를 문 앞에 내놓으면 폐기물 노동자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수거한다. 폐기물 분류는 주로 차량 내에서 이뤄지는데,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보니 상처나 부상이 잦은 편이다.
매립지의 비정규노동자들과 달리 폐기물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이지만, 저소득가정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 이들은 주 6일 일하고 휴일인 토요일에도 교대근무한다. 칼파바티카는 직업안전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안전화와 안전모를 지급했다. 또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나가르준시의 청소 노동자 사누마야 타망은 평소 청소 노동자로 살았다. 22일 폐기물 업체 ‘넵세맥’ 사무실에서 만난 타망은 “칼파바티카를 만나 일하다가 다쳤을 때 응급 처치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교육받았다”며 “값비싼 의료비 탓에 미뤄오던 건강검진도 했다”고 말했다.
전에 없던 비영리 활동에 공공기관도 적극 협조에 나섰다. 수실라 아드히카리 카트만두지구 나가르준시장 권한대행은 “해외 재단의 도움으로 폐기물 관리와 노동자를 지원한 첫 사례라 행정 영역에서도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단체에서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이나 협업 문의가 온다”고 덧붙였다.
칼파바티카는 현재 나가르준시의회를 통해 폐기물 관리와 노동자에 관한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당국과 이어가는 중이다. 사미르 타파 칼파바티카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는 “자치구 내 관련 법령이나 정책이 없는 상황이라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작은 씨앗, 글로벌 펀딩으로 자라다
작은 실험으로 출발한 프로젝트는 물꼬가 트이면서 속도가 붙었다. 칼파바티카는 2022년과 2023년 연이어 GSG 지원을 받은 직후 UNDP(유엔개발계획)로부터 2만 달러(약 28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았다. 청년 기후단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공모 ‘청년기후솔루션(Youth4Climate Solutions)’에 선정되면서다. 최근에는 UN 내 이주아동지원플랫폼 MYCP(Migration Youth and Children Platform)의 마이크로그랜트 사업에 지원해 750유로(약 120만원)의 추가 지원을 이끌어냈다.
지원금이 늘면서 사업 분야도 넓혔다. 지난 7월에는 폐기물 노동자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 교육을 열었다. 10년 넘게 일했지만 적금도 보험도 모르고 살던 폐기물 노동자들은 반겼다. 시의회 앞에서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폐기물 노동자들을 초청해 플라스틱 폐기물 인식 개선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올해는 숲과나눔의 GSG 마지막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GSG 지원은 총 3회 받을 수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이다. 라마 대표는 “노동자들의 병원 문턱을 낮추기 위한 ‘건강할인카드’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소규모 지원금을 활용해 폐기물 노동자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라고 했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저개발국가의 청년들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초기 단계에서 외부 지원을 받기 매우 어렵다”며 “지역의 환경·안전·보건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법을 모색하며 성장해 온 칼파바티카 팀은 국제풀씨(GSG) 사업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이어 “네팔은 지금까지 총 136개 지원팀 중 11개 팀이 선정된 나라로, 앞으로도 풀뿌리 역량을 키워가는 훌륭한 단체들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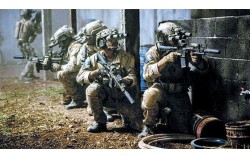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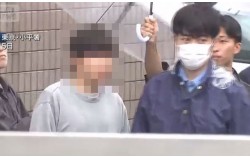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