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금도 중재 나섰던 '조선 3대 소송'…폭행까지 번진 묘소 집착
-
19회 연결
본문

추석을 1주일여 앞둔 지난달 28일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성묘객들이 성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 시대 고종 재위 시기인 1881년 5월 경북 안동. 고성이씨 문중에서 선산 묘역에 누군가 시신을 몰래 묻었다며 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관아에 소지(所志·관아에 내는 서면 청원)를 올렸다.
특히 투장(偸葬) 장소가 명당의 혈을 짓누르는 곳이기에 즉시 옮겨주기를 요청했다. 당시에는 불법 투장이더라도 타인의 무덤을 임의로 훼손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관아에 전후 사정을 적은 소지를 올려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안동부사는 “상황을 조사한 후에 판결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문서 뒷면에 “현장에서 그린 산도(山圖)를 살펴보니 고을에서 지내는 기우제단도 근접해 있어 즉시 파내도록 지시했다”는 추가판결 내용을 기재했다.
또 1890년 2월 경북 예천에 사는 유병호는 이웃 마을의 부자 윤이출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선산 묘역으로부터 수십 보 거리의 장소에 시신을 몰래 투장한 뒤 봉분 작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문중 사람들과 함께 현장으로 가서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경북 안동 고성이씨 이필과 이정찬 산송 소지. 고성이씨 탑동종가 기탁자료. 사진 한국국학진흥원
하지만 오히려 윤이출이 하인들을 동원해 자신들을 새끼줄로 묶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관아에 소지를 올렸다. 문건에 따르면 평소 윤이출이 자신의 부를 앞세워 마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즉시 죄를 다스려주고 무덤을 옮겨가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에 예천 관아에서는 “타인의 산에 불법으로 투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산 주인들을 구타했다. 윤이출을 불러 사람들을 폭행한 죄를 묻고 즉각 무덤을 이장하도록 지시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추석을 맞아 오늘날과는 확연히 다른 조선시대 묘소 관련 문서들을 공개했다. 당시 묘지를 둘러싼 소송을 기록한 ‘산송(山訟)’ 문서들이다. 산송은 노비소송, 전답소송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소송’이라고 불릴 정도로 흔했던 분쟁이다.
산송의 원인은 타인의 묘역에 불법으로 시신을 투장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때 피해 당사자는 관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송 문건을 제출하고 수령은 현장에 직접 가거나 대리인을 보내 상황을 살펴본 뒤 판결을 내려줬다고 한다.

강릉유씨 유병호 산송 소지. 강릉유씨 벌방종가 기탁자료. 사진 한국국학진흥원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성묘 풍경이 180도 바뀌었다. 매년 추석에 선산이나 추모공원 등에 차려진 묘소로 성묘를 가는 이들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점차 화장이 보편화되면서 요즘은 납골당을 방문하거나 수목장을 치른 곳을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화장 없이 시신을 매장하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겼지만, 2023년 기준 화장률이 92.9%에 이를 정도로 이제는 화장이 보편화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사망자 35만 2511명 중 화장을 택한 경우는 32만7374명에 달했다.
개별 묘소를 없애고 합동 묘제를 지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안동 한 종가에서는 문중 구성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벌초와 묘제를 수행하기 힘들어 종택 뒤쪽에 시조 이래 종손의 부모님까지 52명의 비석을 세운 추모제단을 조성해 음력 10월 14일 합동묘제를 지내고 있다. 벌초는 고조부모까지의 묘소만 하고, 나머지는 생략했다.
문중 종손은 “문중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 그 많은 묘소를 벌초하고 묘제 때마다 제물을 운반하는 것이 힘들어 고민 끝에 결정했다”며 “선조들의 혼령을 추모제단으로 모셔와 예를 올리고 묘소는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8일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에서 많은 성묘객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를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영화 ‘파묘’에서 알 수 있듯 고위 관직자들의 산송은 임금이 직접 중재에 나설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반면 오늘날에는 화장률 증가에 따른 납골당 문화가 정착하면서 묘소 분쟁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면서 “산송 자료는 사라진 우리의 묘소문화와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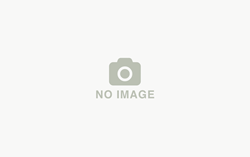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