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잡히면 쫓겨날 거 알면서…그들은 왜 봉쇄된 '가자'로 향하나
-
22회 연결
본문
한국인 시민단체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던 중 이스라엘에 나포됐다. ‘구호 선단’을 표방하는 이들의 출항과 이를 저지하려는 이스라엘의 조치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 스뤠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태우고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매들린호. AP=연합뉴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해상 봉쇄 역사는 200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2006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의회 다수를 차지하자 이스라엘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봉쇄였다. 이후 ‘자유 가자 운동’ 단체가 수차례 바닷길로 가자지구를 넘나들었고 이스라엘은 나포로 맞서다 2009년 1월 해상 봉쇄를 공식 선포했다.
이후에도 지속된 이스라엘과 인권단체의 대치는 2010년 5월 분기점을 맞았다. 터키 인권단체가 주축이 돼 조직한 ‘가자 자유 함대’ 6척 중 마비 마르마라호가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고 9명의 사망자를 냈다. 해당 사건을 놓고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이스라엘군의 조치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판 입장을 냈지만, 제프리 팔머 전 뉴질랜드 총리가 이끈 별도의 유엔 패널은 2011년 9월 이른바 ‘팔머 보고서’를 통해 ‘해상 봉쇄’ 자체는 국제법상 합법이라고 봤다.
201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입항 시도와 나포는 일종의 수순처럼 굳어졌다. 인권단체 측이 구호품을 실은 대규모 선단이 가자로 향한다고 사전에 공개적으로 알리면 이스라엘이 “테러를 지원하는 것과 같다”며 엄포를 놓고 나포 후 추방하는 방식이 되풀이됐다.
저명한 활동가들이 모이는 점도 특징이다. 올해 경우 지난 6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프랑스 유럽의회 의원 리마 하산 등 활동가 12명은 자유함대연합(FFC) 소속 범선 마들린호를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나포됐다. 이후 추방된 툰베리는 3개월 만인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초대 대통령 넬슨 만델라의 손자인 만들라 만델라 등 500여명과 40척 이상 선박으로 글로벌수무드함대(GSF)를 구성해 다시 가자지구로 향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지난 8일 한국인 활동가를 태우고 나포된 선박도 FFC 소속이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가자지구로 출항한 이들 인권단체 선박 31척 중 단 5척만 가자 해안에 도달했고, 2010년 이후엔 접안 사례가 없다고 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해상 봉쇄를 합법으로 본 팔머 보고서 등을 들어 자국 안보를 위해 해당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하마스와 다른 무장 단체들이 로켓포는 물론 땅굴 같은 군사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해상으로 몰래 들여올 수 있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스라엘 내에선 이들 인권단체의 항해가 친(親)팔레스타인 세력의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구호품 보급보다 출항부터 나포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노출을 우선시한다는 지적도 한다. 아슈켈론 항구 등에서 정식 통관 후 육로 보급이라는 대체 루트를 인권단체가 거부하는 점 역시 친팔레스타인 세력의 정치적 선전을 뒷받침한다고 이스라엘 정부는 보고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지난 6월 툰베리를 추방하면서 셀카용 요트를 타고 왔다고 깎아내린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당시 “툰베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가자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소량의 구호품을 가져왔다”며 “이건 우스꽝스러운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10월 6일(현지시간)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 171명을 추방했다. 사진은 추방되는 그레타 툰베리. 이스라엘 외무부 엑스(X)=연합뉴스
반면 인권단체 측은 이스라엘의 봉쇄 조치가 가자지구 주민을 인질로 삼고 팔레스타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평화적 저항을 통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더욱 엄격해진 봉쇄 탓에 가자지구 경제가 파탄에 이른 점도 활동가들의 목소리에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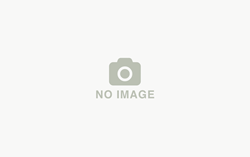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