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인·중증 환자 속 썩이는 ‘욕창’ 잡는다…나노소재 기반 무선센서 개발
-
19회 연결
본문

경남 김해시 한 재활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입원 환자의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자세를 바꿔주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욕창을 예방하고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나노 소재 기반의 무선 센서 플랫폼 기술'을 한국화학연구원, 국립창원대학교와 함께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한국전기연구원
환자·의료진 모두 골치 아픈 ‘욕창 관리’
홀로 몸을 가누기 힘들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노인·중증 환자는 종종 ‘욕창’에 시달린다. 긴 시간 누워 있는 탓에 병상과 맞닿은 신체 부위가 계속 압력을 받아 피부 조직이 손상되기 쉬워서다. 또 대·소변이나 땀에 젖은 침구와 옷이 피부를 자극해 욕창을 발병케 하거나 그 증상을 악화시킨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누운 자세를 자주 바꿔 줘야 한다. 위생 관리도 필수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선 이처럼 환자를 실시간으로 살피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인력 부족 때문이다. 환자 몸에 감지기(센서)를 부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전원 공급 등이 유선(有線) 방식이어서 자세를 자주 바꿔야 하는 환자에게 장시간 사용하기 불편했다. 배터리도 재충전을 해야 해 번거로웠다. 기존 센서가 대부분 압력만 측정 가능해 배설물 등 위생 관리까진 역부족이었다.

경남 김해시 한 재활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입원 환자의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자세를 바꿔주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욕창을 예방하고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나노 소재 기반의 무선 센서 플랫폼 기술'을 한국화학연구원, 국립창원대학교와 함께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한국전기연구원
붙이기만 하면 “실시간 욕창 잡아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필 수 있는 소재·기술이 개발돼 눈길을 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한국화학연구원과 국립창원대와 함께 욕창 예방과 조기 진단에 효과적인 ‘나노 소재 기반의 무선 센서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기연 최명우 박사팀이 ‘나노 소재 개발’, 화학연 조동휘 박사 연구팀이 ‘소재 특성 평가’, 창원대 오용석 교수 연구팀이 ‘무선 플랫폼’ 분야를 맡았다.
이번 기술은 센서가 환자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뿐 아니라 온도 변화, 대·소변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 등 다양한 신호를 감지하면서도 무선(無線)으로 작동하는 게 특징이다. 휴대전화 무선 충전과 비슷한 덕분에 침대 아래에 둔 코일형 NFC 안테나를 통해 센서에 지속적으로 전력이 공급된다. 이 센서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연구팀은 확인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최명우 박사가 욕창 조기 진단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다기능 무선 생체 센서'를 자신의 팔에 부착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한국전기연구원
이 센서를 환자 피부에 붙여 놓으면 병원 의료진·보호자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우 박사는 “가령, 배설물이나 환부의 진물에서 나온 암모니아 가스가 감지되면 ‘지금 환자 관리가 필요하구나’라고 의료진 등이 판단해 즉각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한 나노 소재 역할 커…“비용도 기존 6% 수준”
공동 연구팀은 기존 센서의 소재·기술 한계를 극복하면서 의료 현장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전기연 등 설명을 종합하면, 기존 센서 소재는 열·광원 등 외부 에너지원이 없으면 소재가 활성화되지 않아 암모니아 가스 등 화학 신호를 감지하기 어려웠다. 또 기존엔 압력과 가스 신호를 구분하지 못한 것도 한계였다.
최 박사는 “환자 몸에 단 센서에 열을 가하거나 별도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 현장 여건상 어렵다”며 “이번에 개발한 ‘황화구리(Cus)’란 나노 물질은 상온에서 별도 에너지원 없이도 암모니아만 선택적으로 감지할 수 있고, 이를 무선 센서 플랫폼에 적용한 것은 세계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황화구리)가 나노 구조화돼 있어 암모니아랑 직접 맞닿는 표면적이 늘어 사람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소량의 배설물에서 뿜어낸 저농도 암모니아까지 탐지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존 센서와 비교해 최대 6% 수준으로 생산 단가가 저렴해 가격 경쟁력도 높다고 했다. 상용 ‘구리 폼(Cu foam)’을 단순히 황(S) 용액에 담그는 간단한 방식만으로 황화구리를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어서다. 최 박사는 “암모니아를 가장 잘 잡아낼 최적의 황화구리를 만드는 온도·시간·농도 비율을 여러 실험 과정서 찾아냈다”며 “반도체식 가스 센서와 공정·소재 단가를 따져봤을 때 최대 17배 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최명우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다기능 무선 생체 센서' 기술 원리. 자료 한국전기연구원
실제 병원서 유효성 검증…“의료진 부담 줄 듯”
공동 연구팀은 경남 김해시에 있는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협조를 받아 실제 욕창 위험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유효성까지 검증했다. 전기연 측은 “학·연·병이 함께한 대표적인 성공 협력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이 병원의 이제상 재활의학2과 센터장은 이번 기술이 더욱 발전해 상용화되어 실제 의료 현장에 도입된다면, 환자의 욕창을 예방하고 의료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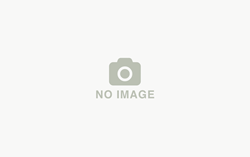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