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석굴암 애초엔 원형 불당…박정희 때 잘못된 고증으로 변형”
-
21회 연결
본문

석굴암 전실, 유리건판 사진, 1912년 11월~1913년 10월 이전 촬영. 사진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박정희 정부 당시인 1960년대 초 석굴암 수리는 신라시대 원형(原形)에 대한 충분한 고찰 없이 이뤄져 지금의 내부 습기 원인이 됐다. 석굴암은 애초에 목조 전실 없이 본존불을 모셨던 원형(圓形) 불당이었다.”
유네스코 등재 30년 계명대 국제학술회의 #강희정 한국미술사학회 회장, 주제 발표 #"목조전실 추가하며 팔부중상 배치 왜곡"
경주 석굴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30년을 기념하는 계명대 국제학술회의(16~17일 경주라한셀렉트)에서 강희정 서강대 교수(한국미술사학회 회장)가 내놓은 주장이다. 강 교수는 16일 ‘원형과 변형: 박정희 시대 석굴암 수리공사’라는 발표문을 통해 통일신라의 재상 김대성이 석굴암을 건설할 당시(751~774년 이후)엔 원형 평면을 지닌 단일한 불당(佛堂)이었다는 가설을 제시하면서 현재 모습이 잘못된 고증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굴암은 일제강점기에 폐허 상태로 발견돼 1913~1915년 콘크리트 보강 수리를 했다. 이후 누수·결로 등 문제가 발생하자 1958년부터 우리 정부에 의해 수리복원을 위한 조사가 시작됐다. 당시 조사단은 ‘근거가 확실한 부분 복원’에 중점을 뒀고 입구를 폐쇄하는 목조전실(木造前室) 설치로 외풍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면서 본존불이 있는 주실의 돔 위에 콘크리트 이중 돔을 씌웠고 팔부중상(八部衆像, 불교의 여덟 수호신) 조각이 있는 전정(前庭)부 상단도 목구조로 덮었다.

석굴암의 일제강점기 보수공사 당시 모습(왼쪽)과 1960년대 수리공사 이후 모습. 경주 석굴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30년 기념 계명대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중 강희정 교수의 발표문 '원형과 변형: 박정희 시대 석굴암 수리공사’에 수록된 자료다.
당시 복원공사를 주도한 고 황수영 박사(동국대 교수)는 공사 도중 발견한 조선 후기 ‘석굴암 석굴 중수상동문(重修上棟文·1891)’에서 목조 보강의 근거를 찾았다. 1891년 석굴암 중수 기록인 이 상동문(상량문)에는 목조와즙(瓦葺)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목조건물에 기와를 얹는 것으로 해석됐다.

석굴암의 1960년대 공사 직후 목조전실 모습(왼쪽)과 현재 모습. 60년대 공사 이후 지붕이 추가돼 전실이 확장된 모습이다. 경주 석굴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30년 기념 계명대 국제학술회의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다.
그러나 강 교수는 이번 발표문에서 당시 목조건물 건설과 전실의 확장은 신라 당시의 원형은 물론 조선 후기까지의 구조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경주도회좌통지도’ ‘경주부’, ‘해동지도’ ‘경주부’ 등 지도에서 일관되게 표기가 ‘석굴’로만 돼 있어 지금 같은 전각 형태의 전실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다.
그는 “조선 후기까지 석굴은 단일한 구조로 목조 가구는 없었으며, 주실이라고 부르는 원형 당(堂) 하나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늘날 우리가 방형(네모) 전실과 원형(동그라미) 주실로 이뤄진, 전방후원(前方後圓) 형의, 말발굽과도 같은 모습의 석굴암이라는 아이디어는 1960년대 보수공사를 거친 후에 새롭게 등장한 패러다임”이라고 봤다.

석굴암의 주실의 입체 구조도. 경주 석굴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30년 기념 계명대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중 강희정 교수의 발표문 '원형과 변형: 박정희 시대 석굴암 수리공사’에 수록된 그래픽이다.

석굴암의 주실과 전실 평면도. 경주 석굴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30년 기념 계명대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중 강희정 교수의 발표문 '원형과 변형: 박정희 시대 석굴암 수리공사’에 수록된 그래픽이다.
문제는 이 같은 패러다임 속에 수리공사가 진행되면서 팔부중상의 ‘왜곡 배치’까지 벌어졌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 사진을 보면 팔부중상은 각 3개씩 직선으로 마주 보는 모습인데, 일제는 수리복원하면서 주변에 방치됐던 마지막 한쌍을 입구 부분에 꺾은 채(굴절형) 배치했다. 1960년대 보수공사는 이를 펼쳐서 좌우 각각 4개씩 직선형으로 배열했는데, 강 교수는 이것이 애초의 배치 형태를 도외시한 채 입구를 넓힘으로써 목조 전실을 보다 넓게 확보하려는 차원이었다고 본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는 “석굴암이 영향받았을 인도 석굴의 이상향이나 당대의 원형 건물 축조 공법을 감안할 때 석굴암의 본체는 원형 주실이고 팔부중상이 있던 곳은 일종의 통로, 현관이었을 것”이라면서 “60년대 공사의 초점은 석굴암이 일종의 법당으로서 관람객을 수용하면서 내부 조각상의 풍화를 막는 데 있었고 그 결과 ‘주실+전실’ 구조로 변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관련 학계에선 석굴암 입구를 막는 목조전실이 결과적으로 내부 환기를 저해하고 습기·결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동물 등의 침입을 막고 현 보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목조전실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있다. 설사 석굴암이 신라 원형에서 왜곡된 형태라 해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30년에 이르는 건축물의 현상 변경이 여의치 않은 현실적 문제도 있다.

석굴암 유리건판 사진, 1912년 10월~1913년 10월 이전 촬영.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강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 1960년대 수리공사가 김대성 창건 당시 석굴암의 원형에 부합하는지보다 다른 관심사에 맞춘 채, 말하자면 박정희 정부가 ‘민족불교와 호국 이념의 상징’으로서 석굴암을 띄워 올린 것에 더 충실한 모양새로 추진됐다는 게 잠정적 결론”이라면서 “석굴암 수리 복원의 다음 단계 논의를 위해서라도 지난 공사의 공과 과를 찬찬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 APEC 경주 개최를 기념해 '석굴암: 통일신라 불교미술과 건축의 정수에서 세계의 문화유산으로'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실크로드 인문학 학술회의에선 이 외에도 우동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가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 석굴암 복원 작업과 그 한계: 배기형과 김중업을 중심으로’라는 발표문을 통해 수리공사 경과를 되짚기도 했다. 기조연설 2건과 총 12건의 논문 발표를 통해 석굴암의 위상과 가치 및 복원의 역사를 살피는 학술회의는 17일 폐막한다.

석굴암에는 1970년대 보존을 위해 유리 벽이 설치돼 현재 석굴 안에는 들어갈 수 없고 멀리서 본존불만 건너다볼 수 있다. 사진은 경주 석굴암 내부. 사진 국립문화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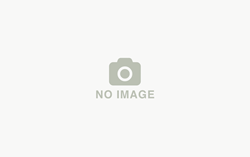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