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유세 올리면 집값 정말 내리나…인상 후 2년 간은 오히려 올라
-
6회 연결
본문
보유세를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인상에 선을 긋고 있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대상에는 보유세ㆍ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 등이 포함된다. 특정 방향성을 정해놓지 않고 세제 관련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세제 개편 필요성 등을 먼저 살핀 후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9일 미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구용역 시기 등을 고려하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은 내년 7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때 무렵에서야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가 강도 높은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 가액비율 상향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정가액비율을 43~45%로 특례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60%로만 올려도 보유세 부담이 50%가량 늘어날 수 있다.
보유세 인상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그간의 사례만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값은 오히려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5~2.7%로 인상하고, 2020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은 2020년에 13%, 2021년에는 16.4% 상승하며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여러 연구 보고서들도 이런 결과를 뒷받침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3년 낸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을 10%포인트 인상해 보유세 부담을 높였을 때 주택가격은 오히려 1~1.4% 상승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2019~2022년 주택가격 변동 등을 통한 연구 결과다. 특히 세법 개정을 통해 보유세율을 올리는 게 아닌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을 올려 세금 부담을 늘린 점도 보유세 효과를 반감시켰다. 다른 주택과 비교하여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은 ‘더 좋은 상품’으로 여겨져 매매 가격이 증가하는 기준가격 효과가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보다 컸다는 분석이다.

보유세(재산세) 계산 방식 그래픽 이미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보고서도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재산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세부담 인상 효과를 상쇄할 만큼 크다면 주택가치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유세는 자산가격에 따라 부담 달라지지만, 조세의 역진성(소득이 적은 사람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큰 세금으로 분류된다. 은퇴한 고령층은 부동산 등 자산은 많지만 소득은 적은 경우가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동성이 풀려 주식·금 등 모든 자산이 오르는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집값을 잡기는 힘들다”며 “게다가 보유세를 과도하게 올릴 경우 강남 등 지역은 고소득자들만 모여살게 돼 지위재(地位財, 사회 내 지위를 알려주는 재화)로의 위상만 더 공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도 고민거리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새 자산평가 등을 통해 보유세를 인상한 독일은 재산세 고지서 발송 후 수백만 건의 이의 신청이 쇄도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도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 이반 등을 우려해 보유세 인상에 선을 긋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보유세가 높은 국가들은 지방 공공재를 누리는 대가로 높은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처럼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해외의 경우 보유세가 높으면 해당 지역 인프라가 우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가격이 더 높아지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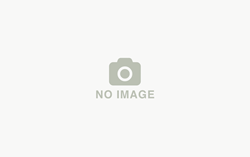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