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기억의 상호작용과 정체성...인간이 인공지능과 다른 점[BOOK]
-
8회 연결
본문

책표지
마음을 담은 기계
정수근 지음
심심
“라면 먹을래요”는 2001년 개봉한 영화 ‘봄날은 간다’에 나오는 대사다. 차에서 내린 은수가 갑자기 차 문을 다시 열고 상우에게 물어보는 장면이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 대화의 행간에 담긴 의미를 쉽게 읽어 낸다. 단순히 배가 고픈지를 묻는 게 아니라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인공지능(AI)이라면 과연 이 말을 사람들처럼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의 한층 진화한 인공지능은 그 말의 맥락과 숨은 의미를 인간처럼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됐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마음을 가지고 사람처럼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올까. 인공지능은 과연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책이 나왔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박사 출신인 정수근 가톨릭대 교수가 펴낸 『마음을 담은 기계』다. 인간의 뇌와 마음의 작동 과정을 연구하는 인지심리학자인 지은이는 이 책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11개의 질문답변 형식으로 세밀하게 분류해 소개한다.
스탠퍼드대와 코넬대 실험에서 사람들은 인간이 쓴 글과 인공지능이 쓴 글을 거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진행된 테스트에선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 중 54%는 자신이 인간과 대화를 했다고 생각했다. 실제 인간과 대화를 나눈 경우에도 참가자들의 67%만이 상대를 인간이라고 판단했다. 대화 상대가 인간인지 기계인지 분별하는 튜링 테스트를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과 유사한 정도로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아무리 인간처럼 반응한다 하더라도 인간과 똑같은 수준의 마음을 갖고 자신을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공지능 챗봇이 “배가 고프다”거나 “자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도 인공지능은 실제로 그런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대화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며 상대방에게 공감하기도 한다. 반면 인공지능은 의미를 이해하는 대신 통계적 연산을 통해 가장 적합한 답을 예측하고 출력하는 데서 그친다.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마음을 가지는 상황이 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은이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결국 인공지능이 마음을 가졌는지 판단하는 것은 인공지능 자체의 능력보다 이를 바라보는 인간의 평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이 실제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인간과 점차 유사해지는 인공지능을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접한다. 인공지능에 쉽게 마음을 투영하고 공감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기억에도 다른 점이 있다. 인공지능과 달리 인간의 기억은 고정돼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며 때로는 원래 기억이 다른 형태로 왜곡되기도 한다. 나의 개인적 기억은 정체성의 기반을 제공하고 주변 사람들의 기억과 인식이 더해지면서 정체성이 완성된다. 인공지능이 점차 인간과 유사한 기억 시스템과 인지기능을 갖추게 되더라도, 개인적 기억과 사회적 기억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정체성은 여전히 인간과 인공지능을 본질적으로 구별하는 요소일 것이다.
지은이는 인공지능을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비유한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경계를 살펴보는 이 책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길잡이다. 인공지능의 특징과 한계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실행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미 인공지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한층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서 산소처럼 돼 버린 인공지능과 공생하는 현명한 길을 찾아내는 게 더 실용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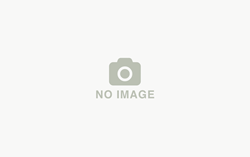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