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는 건 적자" 올림픽 저주…파리 날릴까? 떨고 있는 파리
-
1회 연결
본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 경기장에서 올림픽 비치발리볼 경기가 열리고 있다. 파리=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프랑스 파리 시내 곳곳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가운데 경제 효과가 주목된다. 화려한 올림픽 이면에 막대한 적자를 남긴 전례가 많아서다. 2036년 서울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프랑스는 전 세계 206곳이 참가한 이번 올림픽이 자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블룸버그는 지난 5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따르면 파리 올림픽을 개최하는 프랑스가 장기적으로 120억 달러(약 16조5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건설 등 분야에서 특수를 기대했다.
하지만 개최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졌을 때 항상 ‘남는 장사’는 아니다. 오히려 올림픽을 유치한 국가가 (올림픽이 끝난 뒤) 경기 침체를 겪는 ‘승자의 저주’에 빠진 경우도 많다. 새로 만든 경기장과 선수촌 등 막대한 기반 시설의 쓸모를 찾지 못해서다. 스위스 로잔대가 2022년 펴낸 ‘올림픽과 월드컵의 구조적 적자’ 논문에 따르면 1964~2018년 열린 올림픽·월드컵 43개의 개최 비용은 1200억 달러(약 165조5000억원)였다. 반면 이익은 700억 달러(약 96조5000억원)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올림픽 개최에 따른 손실은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약 57억 달러,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 약 52억 달러,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약 43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리스의 경우 올림픽을 치르느라 국내총생산(GDP)의 3.4%를 들였을 정도로 재정 부담이 컸다. 2015년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배경의 하나로 올림픽 개최를 꼽는다.
이번 파리 올림픽의 경우 과거와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건 유독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강조한 올림픽으로 꼽혀서다. 파리 시내 곳곳의 명소와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대회 뒤 골칫덩이로 남을 만한 시설은 임시 구조물로 짓는 식이다. 예를 들어 주 경기장의 경우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메인 스타디움을 활용해 1조5000억원을 아낀다.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파리 올림픽 개최 비용을 82억 달러로 추산했다. 추산대로라면 2020년 일본 도쿄 올림픽(200억 달러), 2012년 런던 올림픽(171억 달러),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156억 달러)의 절반 안팎이다. 프랑스 리모주대 스포츠법경제학연구소(CDES)는 파리 올림픽 개최가 2018~2034년에 걸쳐 프랑스 수도권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최상의 경우 121억 달러, 중간 수준일 경우 89억 유로, 최악의 경우 67억 달러일 것으로 전망했다. 아무리 프랑스가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해도 간신히 흑자를 낼 수준이라는 의미다.
한국에도 의미심장한 분석이다. 서울시는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도전장을 냈다. 개최지는 2025년 하반기에 확정된다. 서울시 목표도 ‘흑자 올림픽’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쓴 잠실 운동장 등 시설과 이후 만든 국제 스포츠 시설을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며 “시설 투자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선수촌 건립비도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을 활용한 민간 투자를 유치해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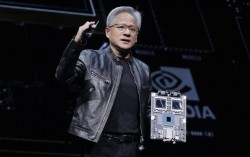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