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아있는 장례식’ 연 김언희 “예술가는 두 번 죽는다”
-
2회 연결
본문

지난 23일 진주 와인바 사건의 장소에서 김언희 시인(가운데 뒷모습)과 후배 시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 시인은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위성욱 기자
지난 23일 오후 3시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 인근 와인바에서 ‘살아 있는 장례식’이 열렸다. 1989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한 뒤 『트렁크』라는 파격적인 시집을 내놓으며 문단의 주목을 받았던 김언희(71) 시인이 성윤석·조말선 등 후배 시인들 몇 명에게 ‘작별인사’를 하겠다고 연락해 만들어진 자리였다.
일흔이 넘은 김 시인은 최근 의사로부터 ‘심장 박동기’를 달지 않으면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다. 온화한 걸음걸이로 와인바에 나타난 그는 “시도 다 썼고, 그동안 챙겨주지 못했던 후배들과 ‘살아 있는 장례’를 미리 치르고 싶었다”며 “오늘이 네 번째 자리”라고 말했다.
앞서 김 시인은 영국 런던 테이트모던 미술관의 간판 전시장 터바인홀에서 한국 국적 작가로는 최초로 단독 전시를 했던 이미래 설치미술 작가로부터 저작권료 형태로 1000만원을 받았다. 이를 새 시집 출간을 겸해 ‘살아 있는 장례식’ 형태로 후배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데 쓰기로 한 것이다.
김 시인은 평소 후배들에게 “예술가는 두 번 죽는다. 한 번은 예술가로 죽고, 한 번은 인간으로 죽는다. 나는 먼저 시인으로 죽을 거다. 그다음에 인간으로 죽겠다. 나는 두 개의 삶을 살았고, 두 개의 죽음을 죽을 거다”고 말했다. 또 “(죽어도) 장례식 같은 것은 하기 싫다”고도 했다. 그래서 그는 시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김 시인은 최근 일곱 번째 시집인 『호랑말코』를 문학과지성 시인선으로 출간했다. 그는 “1년9개월간 (나이 들어 시를 쓰느라) 죽을 것 같았다”며 “돌이켜 보면 내가 산 삶이 시로 쓰였지만, 시가 먼저 산 삶을 내가 뒤따라 간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트렁크』에서 『호랑말코』에 이르기까지 7권의 시집에서 그는 적나라한 성적 표현 등을 뒤섞어 그로테스크한 ‘김언희’만의 독특한 시세계를 구축해왔다. 제멋대로인 사람을 가리키는 『호랑말코』 시집에도 자극적인 이미지의 단어들로 표현된 50여 편의 시가 담겨 있다.
경상대학교 외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사로 일해 온 그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자 전업 시인의 길로 들어섰다. 그때부터 매일 자신이 정한 규칙적인 일상 속에서 오로지 시만 쓰며 살았다고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오직 시 쓰기에도)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그의 말이 시인으로도 인간으로도 마지막 작별인사가 되지 않기를 후배 시인들은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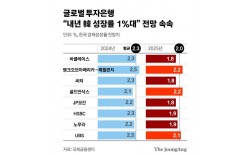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