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스스로 ‘원샷작가’라 불렀다…선명한 색채가 준 그 긴장감
-
1회 연결
본문

케네스 놀랜드의 ‘미스터리스, 님부스’(2001·왼쪽)와 플랙시글라스에 아크릴을 칠한 ‘불꽃들, 굽이’(1990). 1950년대 동심원 그림으로 데뷔한 그는 색과 색의 긴장감을 담는 데 주력, 직사각 캔버스를 벗어났다. [사진 페이스갤러리]
“케네스 놀랜드는 20세기의 위대한 색채주의자 중 하나, 마티스가 그만둔 지점에서 그림을 새로운 시각 언어로 옮겼다.”
미국의 화가 케네스 놀랜드(1924~ 2010)가 암으로 세상을 떴을 때, 뉴욕타임스는 이런 부고를 실었다. 영국 조각가 앤서니 카로(1924~2013)는 영국 매체 가디언에 “내가 만난 가장 지적인 예술가. 지금은 마땅히 받아야 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추상 표현주의 이후 회화의 핵심 인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조사를 게재했다.
좀처럼 보이지 않던 놀랜드의 그림이 지금 서울과 일본 도쿄에서 전시 중이다. 한남동 페이스갤러리 서울과 아자부다이힐스에 있는 이 화랑 도쿄 지점에서다. 서울에는 1966~2006년 사이 작품 11점이 나왔다.
시작은 14살에 아버지를 따라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에서 모네의 그림을 본 뒤였다. 병리학자로 주말이면 그림을 그리던 아버지가 그림 도구를 빌려줬다. 2차 대전 때 공군에 징집돼 이집트·터키에 주둔했다. 전쟁이 끝난 뒤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의 실험 학교인 블랙마운틴 칼리지에 등록, 망명해 온 요제프 알버스에게 색채론을 배웠다.
30대 초반이던 1956년 무렵, 밑칠하지 않은 캔버스에 빨강·파랑·검정으로 동심원을 그린 ‘원’ 시리즈로 이름을 알렸다. 이 그림은 ‘과녁’이라고도 불렸지만, 딱히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 칠한 부분과 칠하지 않은 부분의 대비, 선명한 색채들이 만들어 내는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였다. “나는 색채의 움직임·긴장·간격에 관심이 있다. 내 흥미를 끄는 건 색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지고 영향을 주는지다”라고 말했다.

샘 길리엄의 드레이프 회화가 걸린 전시장. [사진 페이스갤러리]
잭슨 폴록이 바닥에 깔아둔 대형 캔버스에 물감을 흩뿌려 그림을 그리던 때, 놀랜드는 캔버스 한가운데로 원을 모았다. 마크 로스코가 번지듯 그린 사각형으로 보는 이들의 감정을 고양할 때 그는 기계처럼 날카로운 경계선을 만들며 V자 색띠를 그렸다.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 또렷한 경계선을 만들고, 금방 말라 수정이 힘든 아크릴 물감으로 깔끔하게 선처리를 하며 스스로를 ‘원샷 화가’라고 불렀다. 캔버스를 빙빙 돌려 나이프로 물감을 얇게 펴 바르며 표면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게 했다. 여기서 나아가 마름모꼴로, 7각형으로 캔버스를 잘랐다. 그림의 표면에 불과하던 캔버스 자체를 조형 요소로 만들며 1977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회고전을 열었다. 53세 때 일이다.
‘하드 엣지’ ‘차가운 추상’으로 불리던 이 화가의 마지막 그림은 좀 다르다. 밑칠하지 않은 정사각 캔버스 한가운데 자리 잡은 동심원 윤곽선은 젊은 날의 시도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연하고 투명한 색을 화면 전체에 경쾌하게 툭툭 칠한 82세 노화가는, 각 잡고 테이프 붙이던 날카로움을 내려놓았다. 이 또한 충분히 아름답다.
전시장 맨 위층에는 매달려 늘어진 천, 색색으로 물든 종이 작품이 걸렸다. 샘 길리엄(1933~2022)의 만년 작업이다. 놀랜드가 그림 그릴 천을 자를 때, 길리엄은 아예 천을 매달았다. 드레이프 회화라 불린 캔버스 설치다.
길리엄은 1956~58년 미군 병참과 사무원으로 일본 요코하마에 주둔하면서 도쿄에서 열린 이브 클라인 전시를 보는 등 미술을 접했다. 1972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관 전시에 참여했다. 흑인으로는 처음이었다. 베트남전 반대 운동, 흑인 인권 운동이 활발하던 1970~80년대였다.
캔버스를 나무틀에서 해방시켰지만 길리엄 자신은 인종의 굴레에서 해방되지 못했다. 흑인 예술가여서 미술계에서 무시 당했고, 흑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림이 아닌 추상 미술에 전념한다며 흑인들 사이에선 ‘배신자’ 취급을 당했다. 이제는 설치할 때마다 다르게 보이는 그의 드레이프 회화의 기원을 재즈의 즉흥성에서 찾으며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 1991년 서울 워커힐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고, 대구 미국문화원에서 강연도 했다. 전시에는 2018년의 드레이프 페인팅과 함께, 종이(和紙)를 접어 수채물감으로 물들인 뒤 펼친 작품들이 걸렸다. 신부전으로 세상을 뜨던 2022년 제작했다. 접히고 주름진 곳에 우연히 스민 물감이 그의 변칙적 예술 인생을 닮았다. 두 전시 모두 3월 29일까지,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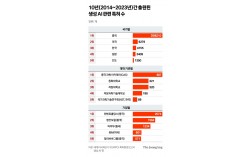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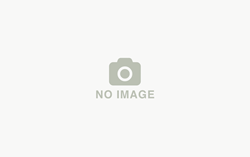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