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년중앙] 판타지 속 판타지를 찾아서 85화. 설날
-
1회 연결
본문
묵은해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
일찍이 한국에서는 음력 1월 1일 설날에 한 해가 시작되면 나쁜 기운과 악귀가 집으로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액을 막는 동물 그림을 문에 붙여두었어요.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액은 막을 수 있지만, 집 안에 머무른 액이나 악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서 1년간 빗질하다 빠진 머리카락을 빗 상자에 모아뒀다가 설날 황혼에 태웠어요. 그럼 그 냄새를 싫어하는 악귀들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악귀를 몰아내고 평온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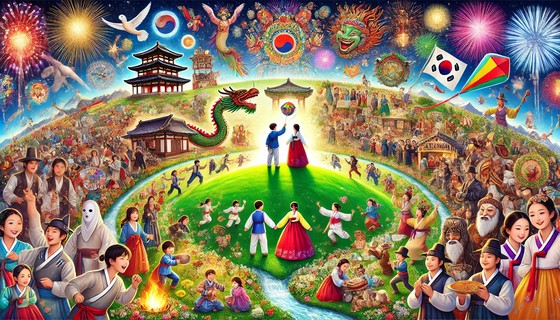
마음만 먹으면 세상의 모든 설날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 새해는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세계 각지엔 다채로운 설날 모습이 존재한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설날을 평온하게 맞이하기 위해 전날인 섣달그믐에서 설날로 넘어가는 시간에 불을 밝히고 밤을 새기도 했어요. 그믐날 밤에 잠을 자면 영원한 수면, 즉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수세(守歲, 해를 지킴)라 불리는 이 밤새우기 풍습을 지키기 위해 이따금 어른들이 잠든 아이 눈썹에 하얀 가루를 발라 새하얗게 만들곤 했죠. 이는 중국 도교에서 전했다고 하는데요. 도교에서는 60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경신일(庚申日)에 잠든 사이 우리 몸에서 살던 삼시충(三尸蟲)이란 벌레가 빠져나와 옥황상제에게 그간의 죄를 고해바친다고 해요. 죄의 무게에 따라 수명이 줄기 때문에 경신일 밤 삼시충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잠을 자지 않았는데, 이를 따라했다는 거죠.
일부 지방에선 부뚜막의 신 조왕신(竈王神)이 매년 섣달그믐 자정에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집안의 죄상을 보고해서 이를 막고자 온 집 안에 불을 켜고 밤을 새웠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건, 옛사람들은 뜬눈으로 밤새며 새로운 해가 찾아오는 것을 반긴 것이죠. 새해가 풍족해지길 바라면서 밥을 지을 때 쌀에서 섞인 돌이나 모래를 걸러내는 도구인 조리를 걸어두었는데, 쌀을 퍼내듯 복을 퍼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세계 각지의 새해에 악령이나 나쁜 기운을 쫓는 풍습이 전해집니다. 일본에선 시메나와라는 금줄로 나쁜 기운을 떨쳐내고, 새해의 신인 도시가미를 맞이하기 위해 문 옆에 가도마츠라는 장식을 놓죠. 소나무·대나무 등으로 만든 이 장식은 주변을 정화하는 힘이 있어 신이 편히 들어올 수 있게 되며, 지역에 따라 집 안 곳곳에 신을 위한 공물을 놔두기도 했어요. 고대 켈트족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에 여름이 끝나고 어두운 겨울이 시작된다고 하여 새해의 시작으로 기념했어요. 이 시기엔 산 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를 나누는 경계가 가장 얇아져서 조상의 영혼이 돌아와 가족과 함께 지냈다고 믿었죠. 동시에 악령도 몰려올 수 있기에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고 집 안의 모든 불을 꺼서 악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불씨를 가져다 불을 피웠어요. 나아가 악령을 속이고 쫓아내고자 가면을 써서 변장했는데, 이게 현재 핼러윈의 변장 풍습이 됩니다. 이란에선 봄이 시작되는 춘분에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사람들은 신성한 불을 피우고 그 불을 뛰어넘으며 부정한 기운을 정화하고, 새 기운을 받죠.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는 어떤 모습일까요. 고대 그리스에선 한 해의 신이 아기의 모습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기는 자라나 노인이 되는데 새해와 함께 다시금 아기가 되는 거죠. 죽음의 시간이 오는 겨울을 지나면 다시 봄이 찾아온다는 재생의 믿음을 상징해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도 과거를 돌아보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마오리족은 마타리키라 불리는 성단이 밤하늘에 새로 떠오르는 6월 말에서 7월 초, 겨울의 시작과 함께 새해를 맞이해요. 남반구에 있어 여름과 겨울의 시기가 반대기 때문이죠. 9개의 별로 이루어진 마타리키는 단순한 별이 아니라 조상의 영혼이 변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마오리족은 죽은 조상을 기리며, 지난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네 조상들이 섣달그믐에 밤새우게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수를 바란다면, 사실 잠을 잘 자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물론 삼시충이나 조왕신 믿음 때문에 잠을 쉽게 잘 수 없겠지만 말이죠. 자리에 누워 눈을 감지만, 눈썹이 하얗게 된다는 말을 떠올리며 다시 깨어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자 불을 훤히 켜두었으니 더 자기 힘들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깨어있는 건 지루해요. 설날에는 한 해를 상징하는 윷놀이나 소원을 들어주는 연날리기 등 놀 수 있지만, 그믐밤엔 그러지도 못합니다.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자연스레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묵은해를 보내니 당연히 그해의 일들이 떠오르겠죠. 잘한 일과 못 한 일, 슬픈 일과 기쁜 일, 그리고 자랑스러운 일과 후회스러운 일….
어느새 시간이 흘러 새해를 맞이하니 자연히 ‘올해는 뭘 할까’를 떠올리겠죠. 그렇게 우리 조상은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묵은해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세우게 한 것은 아닐까요. 제 상상일 뿐이지만, 이런 생각만으로도 새해를 맞이하는 게 좀 더 즐겁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 글을 설날이 지난 후에 보게 된다는 점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새해는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 나라마다 심지어 시기마다 ‘새해의 시작’이 다르거든요. 언제든 여러분이 ‘오늘이 설날’이라고 하면, 새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엔 그만큼 다채로운 ‘설날’이 존재하니까요. 여러분에게 더욱 즐거운 새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홍식 SF&판타지도서관장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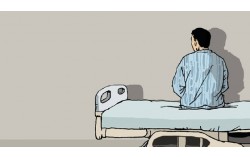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