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마대자루 뒤에서 배어나온 물감…‘단색화’ 하종현의 시작
-
1회 연결
본문

1970년대 대표작 ‘접합’ 시리즈 앞에서 휠체어에 앉은 화가 하종현(90). ‘접합’ 시리즈는 마대자루 뒷면에 물감을 발라 나무주걱으로 밀어내는 ‘배압법’을 쓴 작품이다. [사진 아트선재센터]
“한 가지 방법을 꾸준히 관철하는 아티스트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부정하며 끝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아티스트가 있다. 나의 경우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1975년 공간 대상을 받으며 마흔 살 하종현은 이렇게 인터뷰했다. 그의 말대로 작품세계는 앵포르멜(비정형)에서 기하학적 추상, 실험미술, 단색화로 쉴 새 없이 변했다. 서울 율곡로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는 ‘하종현 5975’는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하던 1959년부터 초기 단색화 ‘접합’ 시리즈가 태동하던 1975년까지 하종현(90) 초기 작품 세계를 조명했다. ‘한국 단색화 1세대 하종현이 이런 작업도 했나’ 싶은 초기의 실험적 작품 40여점이 나왔다.
전시는 홍대 졸업 작품인 자화상에서 시작한다. 20대 자화상을 평생 간직한 채 화가는 익숙한 것들과 끊임없이 결별했다. 1962년 하종현은 어두운 색조의 물감을 실뭉치와 함께 캔버스에 두껍게 바른 뒤 토치로 지졌다. 이어진 ‘도시계획백서’ 연작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71) 시기 새롭게 변하는 도시 경관을 원색의 선과 면이 쭉쭉 뻗어 나가는 기하학적 추상으로 표현했다. ‘탄생’ 연작은 씨앗 무늬를 반복한 작품으로 단청의 원색을 사용하면서 캔버스를 잘라 돗자리 짜듯 엮으며 소멸해 가는 전통에 눈길을 줬다.
1969년 하종현은 미술가 김구림·박석원·서승원·이승조 등과 함께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AG)를 결성했다. “비전 빈곤의 한국 화단에 새로운 조형 질서를 모색 창조해 한국 미술 문화에 기여한다”고 선언하며 출범한 AG에서 하종현은 철사·용수철 같은 일상의 재료로 실험적 작업을 내놓았다. 거울과 두개골·골반 엑스레이 필름을 활용한 설치는 과거 자료를 찾아내 이번 전시에 재제작했다. 1년 치의 검열된 신문 더미와 같은 크기의 백지를 쌓아 올려 언론 통제를 비판한 설치 ‘대위’(對位·1971)도 이 시기 작품이다.
캔버스 뒷면에까지 가시철조망을 붙인 그의 ‘앞뒤 없는’ 실험은 ‘접합’ 연작에서 절정에 달했다. 1974년 “입체 실험에서 얻은 효과를 평면에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질문한 하종현은 구호 식량이 담겼던 마대의 뒷면에 흰 물감을 듬뿍 바른 뒤 나무주걱으로 밀어내는 ‘배압법’을 고안한다. 올이 성근 마대를 틀에 고정한 뒤 물감을 밀어내 앞면으로 배어 나오게 했다.
신정훈 서울대 미대 교수는 “캔버스를 발로 받치고 팔로 밀고 당기며 진행한 하종현의 작업은 1972년 뉴욕 작업실에서 촬영된 김환기의 점화 작업과 대조적이다. 꼿꼿이 선 채 수직으로 세운 붓으로 점을 그려내는 김환기와 달리 하종현의 작업은 실시간으로 온몸을 사용해 캔버스의 양면에서 진행된다”고 말했다.
13일 전시장에서 만난 하종현은 “이렇게 모아서 진열해 두니 모든 작품이 내 소중한 자식들 같다”고 말했다. 안휘경 미국 솔로몬 R. 구겐하임 재단 글로벌 전시 및 아시아 미술 이니셔티브 큐레이터는 “하종현은 지칠 줄 모르는 실험 정신에 헌신하며 회화의 끝없는 가능성을 탐구해왔다”고 평가했다. 전시는 4월 20일까지. 성인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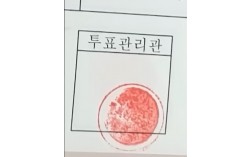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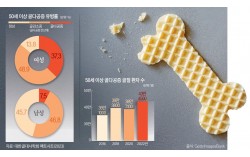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