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건축계 노벨상 받은 건축가, 통유리로 주민들 출입공간 만든 뜻[BOOK]
-
7회 연결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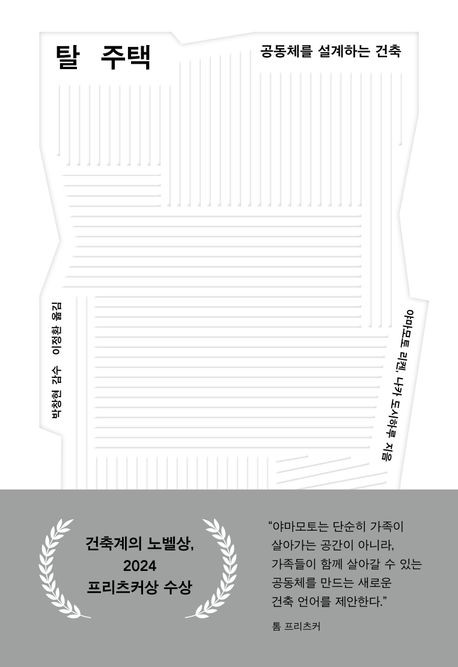
책표지
탈주택
야마모토 리켄, 나카 도시하루 지음
이정환 옮김
안그라픽스
저자 야마모토 리켄은 지난해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았다. 올해 여든인 그는 거의 평생을 일본 요코하마에 살았고 확고한 주택 철학으로 논쟁거리를 몰고 다녔다. 바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판이다. 당연한 개념인 듯한데 저자는 이 탓에 오늘날 우리가 집에 갇혀버렸다고 꼬집는다.

프리츠커상 수상자 야마모토 리켄. 지난해 중앙일보와 인터뷰 때 모습이다. 장진영 기자
1가구 1주택은 19세기 산업혁명 시절 노동자를 위해 개발됐다. 도시로 몰려드는 노동자들을 한정된 토지에 효율적으로 수용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게 만든 주택이다. 이를테면 남성은 회사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가사를 돌보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적합하게 설계됐다. 부부침실, 자녀의 방, 식사하기 위한 다이닝 키친 등 오늘날 아파트를 비롯한 대다수 집이 이런 공간 구성을 지녔다.
하지만 저자는 요즘 1가구 1주택의 가족 모델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본다. 자녀 양육이건 병간호건 가족만으로 생활을 영유하기 힘들어진 탓이다. 더욱이 1인 가구가 늘고 있는데, 이들이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주택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해법은 집을 다르게 만드는 것. 집이라는 사적 공간 안에 외부로 열린 공적 공간을 만들고, 이곳에서 경제활동도 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휴식용으로 살기엔 너무 값비싼 집에서, 일하며 돈 벌며 지역 공동체도 만들 수 있다는 것. 책에는 저자가 설계한 실제 주택 단지들 사례가 나온다.
2010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설계한 ‘판교하우징’은 2층 출입공간이 통유리다. 저자가 의도한, 외부로 열린 공적 공간이다. 지하에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로 2층 공유마당으로 올라와 각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출입공간이 통유리라 훤히 들여다보인다. 이 탓에 초창기 미분양도 났지만, 지금은 거주민들이 건축가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며 어울려 살아가는 주택 단지가 됐다. 물론 저자가 설계한 모든 주택 단지가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가 문제적 건축가로 이름 날리며 꿋꿋이 해온 프로젝트를 읽어 나가다 보면 지금 사는 집과 도시를 다시 바라보고 생각하게 된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