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고국 떠나 깨달은 정체성…숯·한지로 표현한 무채색 풍경
-
4회 연결
본문

이진우, 무제 P24-071, 2024, 린넨에 한지와 혼합재료, 183x224㎝. [사진 리안갤러리]
2016년 파리를 찾았던 고(故) 박서보 화백은 당시 호텔에 걸려 있던 작품을 우연히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작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100% 한국 작가 작품일 거야.” 처음 보고 그렇게 장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말이 맞았다. 한국에서 미대를 졸업하고 1983년 프랑스로 건너가 활동해온 이진우(66)의 작품이었다. 나중에 두 사람은 직접 만났고, 박 화백은 이 작가가 “내 인생의 아버지”라 여길 정도로 든든한 힘이 돼 주었다.
숯과 한지를 재료로 작업하는 재불 예술가 이진우의 개인전 ‘네 번째·물’이 대구 리안갤러리에서 4월 22일까지 열린다. 이진우는 최근 해외 전시가 활발해지고 있는 중견 작가 중 한 명이다. 지난해 6~9월 홍콩 화이트큐브, 11월 상하이 파워롱 뮤지엄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올해는 이번 대구 전시와 더불어 4월 도쿄 동경화랑, 11월 북경 HDM 갤러리에서 전시가 열린다.

이진우는 이번 대구 리안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푸른색 작품도 선보였다. [사진 리안갤러리]
“국민학교(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천자문을 먼저 배웠어요. 잘라 놓은 신문지에 붓글씨를 쓰기 위해 매일 무릎 꿇고 앉아서 먹을 갈았어요. 훗날 숯과 먹, 한지가 제 작업의 재료가 될 줄 그때는 몰랐죠.” 지난 달 21일 대구 전시장에서 만난 그가 이렇게 말했다.
이씨는 세종대 회화과를 졸업한 뒤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제8대학에서 조형미술학(석사)을 공부했다. 이어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인 에콜 데 보자르에서 미술 재료학을 공부했다. 한지와 숯은 프랑스로 유학 간 그가 여러 재료를 탐구한 끝에 찾은 재료다. 그는 “종이와 먹은 내게 가장 자연스럽고 친근한 재료”라며 “먹물은 작은 알갱이, 숯은 큰 알갱이다. 둘은 본질에서 같다”고 말했다.

개인전의 제목이기도 한 이진우의 설치 작업 ‘네 번째·물’. 생성과 소멸, 생명 순환의 이야기를 전한다. [사진 리안갤러리]
한지와 숯을 쓰는 작업은 199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방법은 이렇다. 아크릴 용액을 바른 천 위에 숯가루를 개서 바른 뒤 그 위에 한지를 덮고 표면을 철제 솔로 문지르고 긁어낸다. 이어 한지와 숯이 뒤섞여 응어리지면 한지를 덮고 다시 긁어내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는 “심할 땐 한지 50겹도 붙였다. 몇 겹을 붙이든 항상 맨 마지막엔 한지로 덮는다”고 했다.
숯과 종이가 섞인 울퉁불퉁한 화면은 자연의 풍경에 가까워 보인다. 맨발로 밟아야 할 땅 같기도, 해변의 자갈밭 같기도 하다. 또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바라보면 봉우리가 끝없이 펼쳐진 것처럼 보인다. 오랜 시간 햇빛과 바람을 맞아 풍화된 듯한 무채색 표면은 묵직한 시간의 이야기를 들려줄 듯하다.
이씨는 이번 전시에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흙과 물, 숯과 씨앗을 재료로 한 설치 작품 ‘네 번째 물’도 보여준다. ‘물은 흐르고 씨앗은 자라난다’는 주제를 표현한 작품으로, 관람객이 전시장에서 숯과 흙 위에 싹이 트는 과정을 볼 수 있다. 1985년 독일 슈타인푸르트에서 처음 선보인 이 작품은 1992년 프랑스 팡탱, 2012년 파리에서도 선보였다. 생성과 소멸, 생명 순환의 이야기다. 그는 “내 모든 작품은 ‘그 안에 물이 흐른다’는 상상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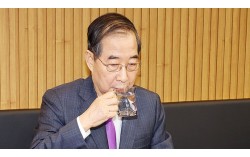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