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벨경제학상 로빈슨 교수 “한국 민주주의 제도, 상당히 회복력 있어”
-
4회 연결
본문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10회 넥스트 인텔리전스 포럼에서 '제도, 정치 그리고 경제성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비상계엄 시도로 인해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마주했으나 한국 국민들은 이를 거부하고 맞서 싸웠다.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의 제도는 상당히 회복력이 있는 것 같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A.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제도, 정치 그리고 경제성장’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로빈슨 교수는 이날 강연을 마친 뒤 한국 제도의 정치적 안정성에 관해 묻는 중앙일보 기자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1980년대 한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싸웠고, 덕분에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가져다준 모든 혜택을 이해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같이 대통령의 권력이 강한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착취적 제도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냐는 질문에 “정치 제도를 설계할 땐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여러 종류의 제도 사이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포용적인 제도를 가진 대통령제 국가와 그 반대인 총리가 있는 나라도 있다”고 설명하면서다. 그는 다만 “민주주의로 전환한 이후 한국은 번영했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며 “이처럼 활기찬 민주주의를 경험했기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한국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로빈슨 교수는 지난해 ‘국가 간 번영의 격차는 주로 제도의 성격에서 기인한다’는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가 2012년 대런 애스모글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함께 쓴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다원적 정치 제도와 포용적 제도가 국가의 성공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용적 제도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이 착취적 제도인데, 이는 특정 집단이 기회와 성과를 독점하는 구조다. 책은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의 대표적인 예시로 각각 한국과 북한의 경우를 보여준다.
이날 강연에서도 로빈슨 교수는 북한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 국가 제도와 경제 성장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강조해 설명했다. 로빈슨 교수는 “단순히 북한에 공산주의, 한국에 자본주의가 정착했다는 이유로 북한이 가난한 것이 아니다”며 “포용적인 경제 정책을 펼친 한국과 대비되게, 북한은 착취하는 방식으로 조직된 경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의 포용적 제도와 북한의 착취적 경제 제도는 모두 ‘정치’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포용적인 경제 제도는 역시 포용적 정치 제도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과 한국의 정치제도를 비교하며 독재 정치에 장악된 북한과 달리 한국은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정치 제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와 아시아, 한국의 민주주의 수치를 나타낸 표를 가리키며 “한국은 세계와 아시아 평균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부 혁신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은 과학적, 문화적으로도 높은 성취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이 궁극적으로 포용적인 정치적 전환을 이룬 결과”라고 강조했다.
로빈슨 교수는 지난 18~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 참석차 방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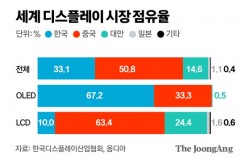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