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낮은 고과 받자 “팀장이 괴롭혀”…이런 ‘을질’ 방지안 무산
-
10회 연결
본문
A씨는 인사 고과에서 낮은 평가를 받자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그는 업무 부족을 지적하거나 보완을 지시한 것을 ‘모욕감’으로, 다른 동료들에게 커피를 몇 차례 사준 일을 ‘따돌림’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3개월 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팀장은 이미 ‘가해자’라는 소문이 난 후였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는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판단 기준에 ‘지속성·반복성’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9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판정·판례) 사례 연구’는 지속성·반복성을 법에 명문화하는 논의에 대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명문화할 경우 당장은 일회적이지만 향후 반복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괴롭힘 범위에서 제외되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를 받은 고용노동부도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 직장 내 괴롭힘 범위가 축소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에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법은 괴롭힘을 ‘직장의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 빈도나 강도와 같은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듀리 라라 노무법인 노무사는 “판단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하다 보니 직장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갈등이 괴롭힘으로 신고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1751건으로,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1458건(12.4%). 특히 검찰 송치 건수는 57건으로, 처리된 사건의 0.59%에 그쳤다. 박소현 노무사는 “상사에 대한 불만이나 불쾌한 업무 지적 같은 사소한 갈등까지 대화나 중재가 아닌 괴롭힘법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정부와 여당은 제도 부작용 완화보다는 노무제공자 등 적용 범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지속성’과 ‘반복성’을 괴롭힘을 판단하는 주요 요건으로 보고 있는데, “판례가 축적되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가이드라인이 형성될 것”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 개정이나 매뉴얼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명문화한다면 근로자들이 굳이 법원까지 가지 않고 노동청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가 법 취지상 어렵다면, 최소한 기준을 명확히 해 급증하는 악용 사례를 막는 장치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선진국들은 오·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괴롭힘을 ‘반복적인 정신적 괴롭힘’이라고 정의한다. 일회성 조치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네덜란드·벨기에·아일랜드·캐나다 등도 지속성·반복성 등 요건이 있다. 김소희 의원은 “법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악용 사례가 발생해 오히려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며 “근로자뿐 아니라 노무제공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만큼 부작용을 빠르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구용역은 업무 효율을 위한 합리적 지휘·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도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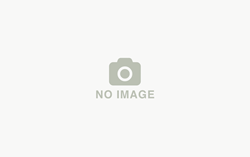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