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냄새나고 시끄럽다? 주민들도 반긴다…도심 속 유기동물 센터
-
4회 연결
본문

지난해 여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입소 초기 루피의 모습(왼쪽)과 입양 간 후 최근 모습. 사진 정씨
지난해 9월 18년간 키운 반려묘를 떠나보낸 뒤 마음을 추스르고자 시작한 ‘유기견 산책 봉사’에서 정혜진(31)씨는 얼굴이 까만 강아지 ‘루피’를 처음 만났다. 약 5개월 전 강서구 한 주택가에서 발견됐다는 루피는 경기 양주시 시 보호소로 옮겨졌다가 안락사 직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관계자의 눈에 띄었다. 뼈밖에 안 남은 영양실조 상태에, 사람 손만 스쳐도 오줌을 쌀 정도로 겁에 질려있었다고 한다. 정씨는 사람만 보면 꼬리를 흔드는 다른 강아지들과 달리 집 안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던 루피가 유독 눈에 밟혔다.

정혜진(31)씨는 지난해 12월 루피를 새로운 가족으로 입양했다. 사진 정씨
정씨는 자전거로 10분 거리에 있는 이 동물복지센터에 자주 들렀다. 그리고 세 달 만에 루피를 가족으로 맞이하기로 결정했다. 제2의 견생을 살라는 의미에서 ‘초롱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정씨는 “전에 키우던 고양이한테 못 해줬던 기억이 있으니 하루빨리 더 잘해줘야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구조 당시 약 4㎏였던 루피는 이젠 7.4㎏의 초롱이로 정씨 가족의 막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씨는 “고양이만 키웠기 때문에 강아지의 특성에 대해 잘 몰랐다”며 “입양하기 전 집과 가까운 센터에 자주 들러서 여러 경험을 했던 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산책 중인 고미희(26)씨와 보호 중인 '마크'. 이수민 기자
도심 속 동물보호소인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가 유기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입양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은 보통 구조된 곳에서 수십㎞ 떨어진 보호소로 옮겨진다. 보호소 대부분이 소음·악취 민원을 피할 수 있는 인적 드문 곳에 있기 때문이다. 한 번 버려진 동물은 구조와 동시에 고립되는 셈이다. 보호소는 밀려들어 오는 유기 동물 수를 감당하지 못해 공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행한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견된 유기동물 5176마리 중 2181마리(42.1%)는 보호소에서 폐사 또는 안락사했다.
동물복지센터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유기된 동물을 서울 밖이 아닌 도심 한복판에 두기로 했다. 안락사 위기에 놓인 동물을 센터로 데려와 건강검진과 미용, 사회화 훈련 등을 시키고 산책 봉사자를 모집해 사람과의 접촉면도 늘렸다. 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배진선 서울시 동물복지시설팀장은 “대형보호소 한 개를 짓는 것보다 여러 개의 소형보호소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입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상처받은 동물들도 시민 봉사자들을 자주 만나며 치유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암동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내 병원. 보호 중인 유기견 한 마리가 치료를 받고 있다. 이수민 기자
서울시는 2017년 개소한 상암 센터를 시작으로 구로(2020년), 동대문(2023년)에서도 센터를 열었다. 입양률이 30%를 못 넘는 일반보호소와 달리 센터에선 보호 개체 수 대비 입양률이 70%를 웃돈다. 올해 상암 센터에서만 88마리의 유기동물이 새 가족을 만났다.
지난 31일 찾은 마포구 상암동 동물복지센터에는 20여 마리의 강아지·고양이가 수의사와 사양 관리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센터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고양이, 미용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꽃단장하는 강아지, 입양 가기 위해 ‘핼러윈 포토 부스’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는 강아지 등이 꼬리를 흔들며 봉사자들을 반겼다. 대부분 애니멀 호더(사육 능력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집이나 시장 등 길에서 구조되는 사연 있던 동물들이다. 포메라니안 마크와 40분간 산책하고 온 고미희(26)씨는 “언젠가 여건이 되면 한 마리 입양하고 싶다”며 “풀냄새를 맡으며 행복해하는 강아지들을 보면 힐링 된다”고 했다.

지난 31일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의 현황이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다. 이수민 기자
서울시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유기동물 센터를 도심에 유치하려는 노력이 커지고 있다. 2021년 동대문구 제기동에 문을 연 ‘발라당’ 입양센터는 동물보호단체 ‘동행’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후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0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단체로 산책 봉사를 와 강아지 14마리와 산책했다. 최미금 발라당 센터 대표는 “소규모로 운영해 소음 등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다”며 “오히려 동네 주민들도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친 센터 강아지들을 예뻐해 주신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발라당' 입양센터에 자원봉사를 온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강아지들을 산책시키고 있다. 이수민 기자
다만 도심 속 유기동물 센터들 역시 주로 작고 어린 개체만 입양 보내는 점은 여전히 한계다. 대형보호소에서부터 입양 보내기 쉬운 7세 미만, 7㎏ 미만 개체 위주로 데려오기 때문이다. 엄격한 입양 가족 심사를 거치긴 해도 사후 모니터링이 1~2개월에 그치는 점 역시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어웨어 대표는 “소규모 센터를 운영하며 입양에 집중하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추세”라면서도 “소형·품종견은 복지센터에, 대형·믹스견은 안락사 제도가 있는 대형보호소로 양분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동물들을 편견 없이 접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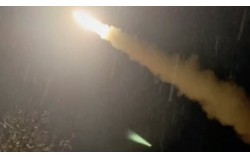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