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난자 채취 후 아내 사망"…유명 난임병원에 내려진 판결은
-
1회 연결
본문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김정연 기자
아기를 원했으나 갖지 못했던 부부는 4년 전 서울의 한 유명 난임병원을 찾았다. 호르몬제를 투여한 뒤 난자를 채취하고 휴식기를 가진 뒤 다시 반복하는 일을 아내 박모씨는 해를 넘겨 거듭했다. 2021년 12월 6일은 세 번째 채취술을 받는 날이었다.
보호자 대기공간에서 기다리던 남편 장모씨는 간호사 한 명이 급하게 뛰어가는 걸 봤을 때만 해도 불행을 예감하지 못했다. 아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으리라곤 꿈에도 모른 채, 뭔가 일이 터진 듯 한데 왜 바로 119신고를 하지 않을까 의아했다고만 한다.
장씨가 보지 못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은 이렇다. 오전 11시 4분,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박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채취술을 진행했고 8분 만에 끝났다. 의료진은 박씨 손가락에 꼈던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떼고 회복실로 보냈다. 11시 12분에 걸어서 회복실로 들어간 박 씨는 28분 만인 11시 40분에 퇴원 안내를 하러 들어온 간호사에 의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57분에 부른 구급차는 6분 만에 왔지만 박씨는 이후 네 군데 병원을 돌면서도 깨어나지 못했고 이듬해 3월 가족 곁을 떠났다.
아내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장씨는 병원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 주채광)는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과실과 박씨의 비가역적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의료진의 책임을 70%로 봤다. 재판부는 “11시 40분 박씨가 의식 없이 발견될 때까지 의료진이 상태를 관찰하거나 산소측정기 같은 장치로 감시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조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응급조치에 나아갔다면 박씨가 비가역적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지 않았을 수 있었다”고 했다.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 해당 병원은 회복실에서 환자 감시를 위한 이같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구글 이미지 캡쳐
“회복실에서까지 손가락에 부착하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가지고 가진 않았나요?”
“네, 환자분이 완전히 깨서 걸어서 이동했기 때문에….”
프로포폴 투여 후 의료진이 환자 감시를 어떻게 해야 했는지는 항소심에서도 쟁점이었다. 지난 2월에는 사고 당일 회복실 담당 간호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시술 직후 산소포화도가 정상이었기 때문에 장치를 제거하고 이동시켰다. 다른 환자에게도 같은 식으로 한다”며 “회복실 방은 7개 정도고 2~3명의 간호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며 환자를 체크했다”고 했다. 병원 측은 “프로포폴 투여 후 정상적으로 회복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무호흡 및 심정지 상태가 된 것은 현대 의학 수준에 비추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 17-1부(부장 한규현·차문호·오영준) 역시 지난 14일 “박씨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판결했다. 병원 측 책임 비율도 다소 높인 75%로 인정했다. “권고되는 투여량에 비해 많은 양을 투여했다면 더욱 세심하게 박씨의 상태를 관찰했어야 했으나, 회복실에는 지속적인 환자 감시 시스템이나 의료진이 비정상 상태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모니터링·알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장씨는 이외에도 의료기록 조작 등을 주장했고 재판부도 “일부 기록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으나 “실체적 진실은 형사소송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며 이번 과실 판단에 고려하지 않았다.
장씨는 의료진을 상대로 과실치사·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 건도 진행 중이다. 항소심에서 1심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왔지만, 장씨는 “민사는 제게 큰 의미가 없고 저 사람들이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기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검진 받을 때도 프로포폴을 사용하니 회복실에서 실시간 감시 장비를 사용하는지 등을 잘 확인해 보라고 주변에도 얘기한다. 아내 같은 사고가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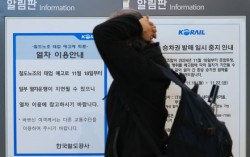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