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52시간 예외' 빼고 특별연장근로? "반도…
-
1회 연결
본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문 수석부의장. 뉴스1
“칩 설계의 경우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계획한 대로 절대 안 나와요. 설계를 수정하고 다시 시뮬레이션 돌리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데, 이걸 주 52시간제 때문에 중간에 멈추면 일이 안 되죠.” (前 반도체 설계 부문 연구자 A씨)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논의가 막판 조율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적용 예외’ 규정을 빼고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쪽으로 기울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이 주제로 토론회를 하며 기업들 목소리를 듣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기존 야당 입장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이다. 현장에선 “업계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이러다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라는 호소가 나온다.
“특별연장근로제 활용? 현실 모르는 소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시도 논의 규탄과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반도체특별법 논의의 핵심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하냐 여부다. 한국은 모든 업종에 엄격하게 주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적용하고 있지만, 반도체 업계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일본은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를 활용해 일부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 노동시간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미 ‘특별연장근로’라는 제도를 이용해 부족한 노동시간을 채울 수 있다며 반발한다. 특별연장근로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연구·개발(R&D) 업무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반도체 기업 R&D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반도체 신제품 연구개발을 위해선 주요 엔지니어가 6개월~1년 정도 집중 근무가 필요한데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주장한다. 당장 절차적 복잡성이 문제다.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는 지난 3일 국회 토론회에서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하면 연장 신청을 새로 해야 하는데 신규 신청 때보다도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회사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신규 신청 시에는 직원의 개별 동의와 사유 증명을 받는데, 연장 시엔 적정성 등 요건을 추가로 요구한다.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추가 근로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에 증빙 자료까지 첨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절차가 복잡할뿐만 아니라 눈치도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를 하려고 해도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많다. 예컨대 최근 중국의 딥시크(DeepSeek)가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을 공개하자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웹서비스 등 미국 빅테크들은 곧장 자사 플랫폼에 R1 모델을 앞다퉈 탑재했다. 개발자들이 R1을 통해 더 빠르게 AI를 테스트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급변하는 만큼 예측이 불가해 R&D 인력을 예측하고, 미리 허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반도체 혁신과 노동시간과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2년간 삼성전자는 R&D 인력에 43만 시간이 넘는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한 반면, 지난해 최고의 성과를 낸 SK하이닉스는 한 차례도 해당 제도 활용을 안 했다는 자료(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주요 근거다. 하지만 김재범 SK하이닉스 R&D담당 부사장은 “현장에선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구성원 개별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 등 절차로 실제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美도 고강도 근무 불사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로고 AFP=연합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고강도'의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비디아 직원의 경우 새벽 1~2시까지 일하는 건 물론 주기적으로 주7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류더인 전 회장은 지난해 미국 애리조나 공장 근무시간에 대한 임직원들의 불만을 듣고 “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이 통과할 경우 군인 없이 총과 총알만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황 본부장은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AI 패권 전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가장 핵심인 인력 문제를 빼버리고 다른 지원책만으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적은 보수는 해결해야 할 숙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의 R&D 개발자들은 3억~4억원을 받으면서 일하지만 한국 연구원들은 1억원대”라며 “장기적으론 충분한 보상이 되는 환경, 교대가 가능한 인력 풀을 확보해 선순환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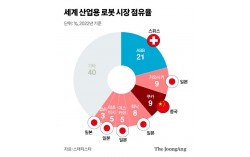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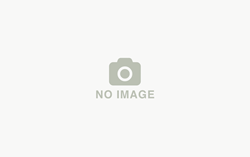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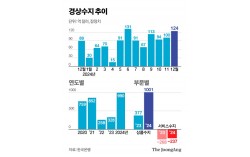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