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김부장은 1000만원 더"…희비 갈린 퇴직금, 무슨일
-
16회 연결
본문
삼성전자 프린팅솔루션사업부(현 HP에 매각) 퇴직자 A씨와 SK하이닉스 퇴직자 B씨의 희비는 보상 규정속 ‘문구 한 끗’ 차로 갈렸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로 A씨는 퇴직금이 최대 1000만원 늘어날 길이 열린 반면, SK하이닉스의 B씨는 한 푼도 더 받지 못하게 됐다. 법원이 삼성전자 성과급은 ‘임금’으로, SK 성과급은 ‘경영 보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 판단을 기준삼아 보상체계 재정비라는 고차방정식 풀기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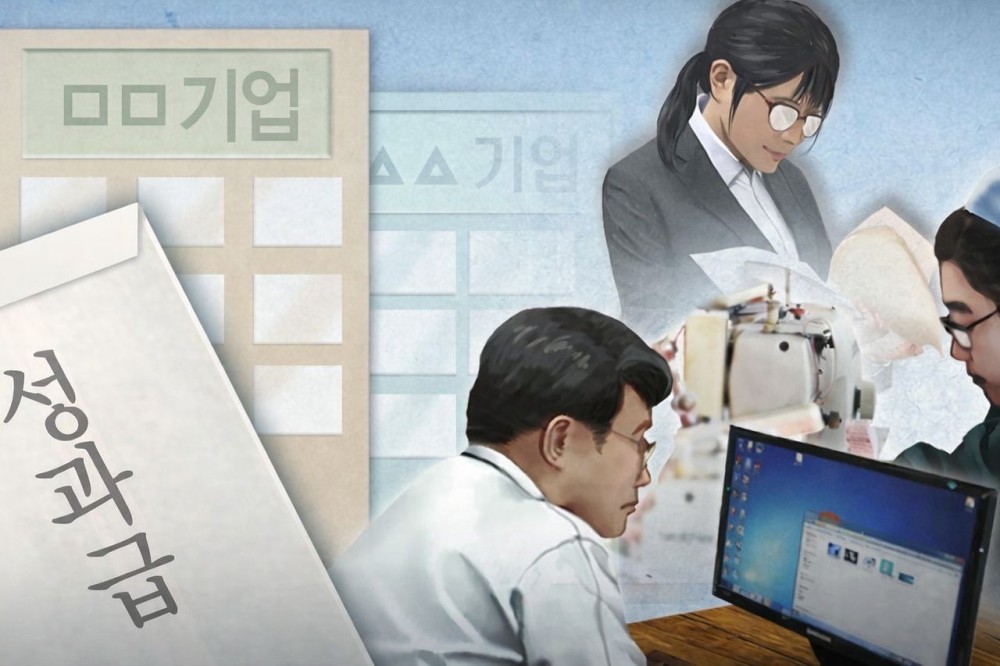
성과급 일러스트. 연합뉴스
법원이 본 임금성 기준은
22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마다 ‘성과급을 대체 어떻게 설계해야 하느냐’를 두고 인사·법무팀의 논의가 분주하다.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성의 핵심 잣대는 ①사용자(회사)의 지급 의무(취업규칙 등 명문화) ②근로의 대가성 ③지급의 계속성·정기성 등이다.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TAI)의 경우 취업규칙에 지급 대상과 조건이 상세히 규정되고, 사전에 확정된 산식에 따라 지급됐기 때문에 임금성이 인정됐다.
반면, 삼성전자의 초과이익성과급(OPI)과 SK하이닉스의 생산성격려금(PI)·초과이익분배금(PS)은 영업이익 등 상대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에 더 크게 좌우되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국내 10대 그룹 임원은 “직원들에게 보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정교하게 만든 취업규칙이 (돈을 지급해야하는 사측에겐) 오히려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됐다”고 토로했다.
기업 입장에선 성과급이 ‘열심히 일한 대가(임금)’가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이익 공유’의 성격임을 명확히 해놓는 게 유리한 셈이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비치지 않도록 개인이나 사업부의 실적보다는 전사적 재무 상태와 연동하는 식의 설계가 기업에게 효과적”이라며 “다만 취업규칙 개정 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노조 합의가 필수적인지 등 법적 절차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기업들은 과거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 항목에서 제외되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현금성 수당 대신 복지포인트를 확대했던 사례 등을 참고해 다각도의 ‘우회로’를 검토 중이다.

정근영 디자이너
재계, ‘소송 도미노’ 번질까
판결의 여진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4일 삼성전자 퇴직자 22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3일에는 또 다른 퇴직자 40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를 냈다. 이미 삼성전자서비스·삼성화재·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노동조합과 퇴직자들도 소송 채비를 마쳤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노조는 임금채권 시효(3년) 내에 있는 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체소송인단을 모집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에 제기된 소송에는 반도체 사업부 등에서 수십 년간 일했던 고숙련 퇴직자들이 대거 합류했다. 법조계에선 이들의 요구가 인정될 경우 근속연수와 성과급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4000만~5000만원의 퇴직금을 더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소송을 맡은 박창한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는 “삼성그룹 퇴직자들은 물론 다른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여러 후속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근로정책팀장은 “대법원이 임금으로 인정한 TAI 역시 매출액, 세전이익률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재무성과 비중이 큰 점이란 점에서 (판정이) 아쉽다”며 “기업별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소송 도미노와 제도 변경 과정에서의 노사 갈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댓글목록 0